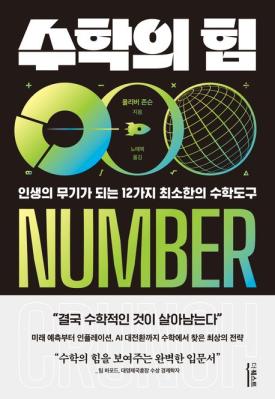고등학교까지는 수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왜 필요한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공부가 실제로 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수능에 실제 수학이 실생활에 쓰이는 방식을 들어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 것만해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어문학 계열이었으니까 수학공부는 당연히 손 놓았고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만으로 신문이나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었었다. 이후에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미분과 적분으로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왕이면 수2에 나오는 미적분의 어려운 부분도 좀 더 공부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생겼었다. 공부하는 김에 조금만 더 했더라면, 문과라서 수2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재미있게 배워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이기 시작했다. 수학적인 개념이야 배운 것이 남아 있었지만 수적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간혹 함께 일하시던 상사님이 '수적으로 그게 감이 안와?'라고 하셨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확률통계는 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아쉽다고 지금와서 수학의 정석을 붙들고 있기에는 나의 집중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을지에 늘 고민이 있었다.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책이 지금 읽게된 수학의 힘이었다. 아마도 독서통신연수를 신청하느라 이책 저책을 찾고 있던 중 수학에 대한 책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들 중 내용을 칭찬하는 말들이 많았고 독자들의 한 줄 서평도 달려 있는 것이 보여 이 책을 선택했었다.
이 책의 첫 부분은 오히려 수학이 만능인 것처럼 접근하는 수학지상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함수를 통해 실제 경제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제상황을 함수로 만들어 보지만, 그것이 간단한 변수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다항함수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컴퓨터는 제한된 기간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럴듯한 함수 그래프를 만들어 내긴 하겠지만 그런 곡선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며 미래값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반면 제한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어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 즉, 저자는 오컴의 면도날(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들어 단순한 모델에 대한 보편적 선호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내가 좋았던 부분은 수적 민감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이었다. 저자는 뉴스에 나오는 각종 숫자에 어느 정도 부정확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정확성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큰 숫자가 나와서 감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당 숫자로 바꿔 생각을 해보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인당 얼마인지 생각해 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큰 숫자를 가지고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논리적 흠결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하나 내 경우 놀라운 발견은 로그지수함수의 유용성이었다. 사실 로그함수를 이용하면 과도하고 복잡하게 큰 숫자들의 대소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정도가 내가 아는 효용의 모든 것이었는데, 저자의 말로는 조금만 변수가 변화하면 과도하게 변화하는 지수함수에 로그함수를 취하는 순간 그 큰 숫자에도 방향성이나 특징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사실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
물론 다소 아쉬운 점들도 있었다. 아마도 번역서이다보니 생긴 문제로 보이는데, 책에 나온 용어들과 우리가 아는 용어가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참을 무슨 이야기를 설명하는지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어느정도 읽고 나면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한 얘기였고 이 부분 용어가 우리가 공부하던 때의 용어와 달라졌구나' 또는 '아, 이 함수를 설명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수학의 정석에 나온 설명과 좀 다른 용어와 구조로 설명되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곤 했었다.
그런 아쉬운 점을 제외하곤 우리가 수학적 감각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수학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를 보여주어 매우 유용했다. 혹시 미적분이나 확률통계의 언덕을 앞에 두고 내가 저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이 책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싶다. 왜 이들 분야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얼마나 아쉬워할지 꼭 얘기해 줄 때 이 책의 내용들을 인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 사회수업에 일일교사라도 신청을 해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