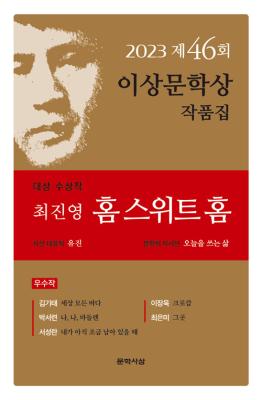이글을 읽으면서 우선 걱정이 된것이 작가의 건강상태였다. 소설인지 수필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그 차분함과 뭔지 모를 적막함이 마구 느껴졌다. 홈스위트홈이라는 달콤한 단어가, 뭔지 오래 여행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왔을때의 적막함과 귀에서 쉿하는 쇳소리가 나면서 먼가 외로와지는 그런 느낌이 동시에 든다. 죽음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대하는 삶의 자세. 누구나 결국은 겪게 될 일이기에 저런 자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겪게 될 일이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몇십년뒤에 오게 될지는 모를 일이다. 남편이 울면서 미래의 상황을 담담히 말하는 것을 들으며 운다. 그런 것, 감정들이 너무나 와닿고 느껴진다. 엄마와 병을 치료하는 문제로 차안에서 다투는 이야기.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환자는 남은 시간을 더 이상 병원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더더 죽음이라는 생각을 목전에 두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것. 그려지고 느껴진다.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작가의 상황을 유튜브로 찾아보았다. 다행이 수필은 아니고 소설같이 보이긴했는데 모르지, 그 내막은 나도. 건강하기만을 바랄뿐이고, 저런 슬픈일이 나에게는, 나의 가족에게는 최대한 늦게 일어나기를 바랄뿐이다. 그런 적막함. 슬프지만 당장은 서로 울지않고 버티고 있는 차분하고 조용한. 날씨로 치면 비가 오는 것은 아니나 우중충한, 마구 춥지는 않지만, 싸늘한 가을저녁의 날씨. 그런 상태이고 그런 기분이겠지, 날씨로 묘사한다면 딱 저럴것 같다. 그런 와중에 추운 집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채 두꺼운 내의를 입고 있는 그런 기분이겠지. 어쨌든 나는 반가워서 말을 걸 거야. 네 영혼이 나타나면 너무 반가워서, 라는 말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말이 아닐까? 자식을 먼저 보낼 준비와 그 이후의 만남을 준비한다는 것. 작품론에서 나오는 그 심리도 슬프다. 엄마가 비로소 자신의 항암치료 거부를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 맞다. 그런 마음인것이지. 읽고 나니 더더욱 슬프고 가슴이 무거워져 옴을 느낀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언제 그 시기가 올 것인지. 나도 매일 일기를 써왔었다. 그것이 93년 대학교 1학년때부터니까 거의 30년 이상을 써온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더이상 쓰지 않는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다보니 쓰지 않게 된 것인데 그렇게 쓴 기록들이 남아서 결국에는 내가 떠날때 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다. 여러모로 인생에 대한, 그 마무리에 대한 차분한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다. 가족과 저런 대화를 한다는 것. 상상조차 두렵다. 나는 영혼만 남기고 갈 생각 없거든. 내 몸이 죽으면 내 영혼도 죽는거야, 그러니까 죽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고 그런거 절대 하지마. 나쁜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대화겠지. 그와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되기만을 바랄뿐이다. 폐가를 고쳐서 살기 위한 마지막 노력들. 저 위에 내가 쓴 그런 싸늘한 가을 저녁의 날씨와 우중충한 하늘이 딱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다. 아마 폐가를 방문한 날이 화창하거나 날이 따스한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아마 그런 날씨에 내 몸이, 내 가족이 그렇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더욱 슬픈 광경이 될수도 있겠다. 친척이 아프셔서, 항암치료로 시골 큰 병원에 누워계신적이 있었다. 다행이 그 분은 지금 건강히 회복해서 지내시는데 그떄 병문안을 갔을때, 날씨가 무척 화창한 봄이었다. 병원 밖에는 꽃봉우리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나와 집사람은 병문안을 마치고 시골 병원의 풍경을 보면서 걸었다. 우리가 병문안이었기에 이렇게 날씨와 계절을 볼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날씨에 병원안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두배로 더 비참하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던 기억도 떠올릴 수 있었다. 세상에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많다. 기쁨도 많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더 힘들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기억에 남고 그런 것들이 더 오래 잔상이 되며 결국 그 것들 짊어지고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삶은 고달프고 힘들며 슬프다. 그 모든 것을 같이 한 가족들과의 이별도 너무나 가슴아린 일이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