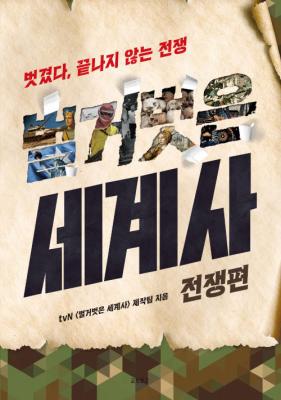중세가 지적 역사에서 암흑기 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세 천 년간 대부분의 시기에는 과학에서 암흑기라는 표현이 적절해보인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한 스콜로 철학에 의해 현실과 경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스콜라철학에 의해 현실과 경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명막을 이어갔다. 특히 스콜라 철학시기에 활동했떤 오컴은 면도날리알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두 이론이 존재할 떄 더 간ㄷ난한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고 방식이다. 오컴의 면도날처럼 이론을 정립하는 방법과 논쟁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한 가정을 덧붙이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논쟁을 담론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결국 과학적 담론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중세 말이 되어서야 코프레니쿠스와 갈릴레리의 등장과 함꼐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코페르니쿠스는 15세기에 활동했던 폴란드의 천문학자로 1400년간 지리로 받아들여진 천동설을 비판이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즤 저서에서 그는 태앙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세번쨰 행성으로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처음 지동설을 공론화한 인물이 코페르니쿠스임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에서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건 갈릴레이가 된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그는 경험적 관찰자료와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동설을 지지했따. 그는 우주는 수학문자로 쓰인 책 이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자연과학적 원리에 수학을 적용하기 이해 힘썼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근대 과학을 출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갈릴레이가 일반적으로 과학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갈릴레이의 저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코페르니쿠스의 2대 세계 체제에 관한 대화가 교황청에 의해 금서가 되고, 재판에서 그의 견해는 철회할 것을 강요받은 것도 그의 근거가 코페르니쿠스에 비해 수학적이고경험적이었기 떄문이다. 도대체 수학으로 설명했는지의 여부가 왜 그리도 중요한가. 수학인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찾아낸 학문 체계중 가장 진리와 가깝다고 여겨지기 떄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학이 단지 사람들 간의 약속이므로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나 연산기호의 표기 방법은 사회와 문화에 따르면 당연히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어느 사회를 박론하고 동일하게 작동한다. 수학이 단순이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의 예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화에서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살기로 가정해보자. 실제로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건축을 한다면 그 건축물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수학은 허구나 약속이 아니다. 수학적 표현은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은, 하나와 둘이 만나면 셋이 된다 라는 내적 의미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다. 끝 없는 의심속으로 데카르트는 참전해 들어갔다.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는 의심의 바라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다흘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그 끝에 데카르트의 발이 닿았다. 어떠한 극단적인 가정으로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다 고로를 넣을 경우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잇는 사실로부터 나의 존재함이 발생되는 것 처럼 보인다. 테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생각한다와 존재한다가 어느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었다. 그런 미세한 차이는 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우리에게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어쨌거나 유명한 앞의 명제를 사용하기로 하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의심할 수 없는 제1명제로 불렀다. 이 명제는 나눠서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나는 생각한다 부터 알아보자. 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생각한다는 것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명제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을것인가에 대한 보편지식이라 해도 절대 의심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끝없는 의심속으로 테카르트는 참전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