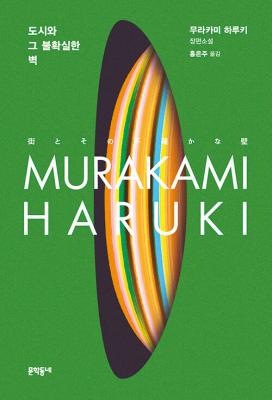이 책은 2017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이후 6년 만에 나온 장편소설이다. 책 외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책 내부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이전 하루키의 장편소설인 <1Q84>나 <기사단장 죽이기>가 나올 때는 서점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뉴스에도 몇 번 오르내리는 등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의 책은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은 듯 했다. 점점 더 순수 문학이 소외받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으로 문학을 구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장르문학과 비장르문학으로 구분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장르문학이 더 득세한 듯하다. 혹은 상실의 시대/노르웨이의 숲을 보았던 하루키 세대의 영향력이 줄어들며 하루키의 인기가 점점 사그라들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지금도 충분히 이슈인데 내가 놓쳤을 지도 모른다. 판매 부수 등을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 책은 하루키의 장편소설 중 드물게도 작가의 후기가 있다. 1980년 잡지에 기고했지만,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혹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 않아 유일하게 출판하지 않은 <거리의 불확실한 벽>이라는 하루키의 단편 소설이 있다. 수십 년간 하루키는 그 작품이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줄곧 불편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그 단편 소설을 다듬어서 장편으로 만든 것이다. 그 단편 소설 뿐만 아니라 이 책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세상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1985년의 장편소설과 큰 관련이 있다. 이 책은 1, 2, 3부로 나뉘는데 이 책의 1부는 <세상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절반과 거의 동일하다. 높은 벽으로 둘러쌓인 도시. 일각수가 드나들며 도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떼어놓아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설정은 동일하다. 두 작품의 이야기가 연결되거나 하나를 모르면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두 작품 모두 단일로 환결성 있는 작품이다. 같은 메타포인 높은 벽으로 둘러쌓인 도시에서 시작한 서로 다른 이야기의 결말이라 할 수 있겠다. 1980년의 어느 단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1985년 <세상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에서 한 차례 매듭이 지어졌고,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이 책 <도시와 불확실한 벽>에서 다른 방식으로 결말이 난다.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재미이다.
단편소설이나 에세이와는 다르게 하루키의 장편소설들은 읽기 쉽지만 난해하다라는 평을 주로 받아왔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이다.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섞여 있고, 독특한 설정을 가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전에도 몇 번 읽어본 적 있는 독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겠지만 그렇지 않은 독자들은 다 읽고 나면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읽는 것이다.
하루키가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글을 쓰지는 않는다. 수십 년간 장편소설을 쓰며 하루키는 몇 가지 한정적인 주자에 몰두해왔다. 특히 최근 장편소설인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작품 외 몇 가지 언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루키는 타이과의 연대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린다. 소설가는 소설가답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성향이 소설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처럼 생생한 현실의 이야기와는 다르다. 그렇지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현실을 빗댄 우회도 아니다. <동물 농장>에서는 농장=제정 러시아, 나폴레옹=스탈린처럼 현실의 그것과 1:1 매칭이 되는 현실의 실체가 있다. 하루키의 소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매칭 가능하다 할지라도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으며, 사람마다 어느 것에 매칭 시킬지는 자기 나름이다. 그렇다고 어느 것이나 끼워 맞출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다. 끼워봄직한, 그리고 매칭 시키는 그 과정에서 소설을 다층적으로 즐길 수 있는 키워드가 앞서 말한 타인과의 연대, 그리고 창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