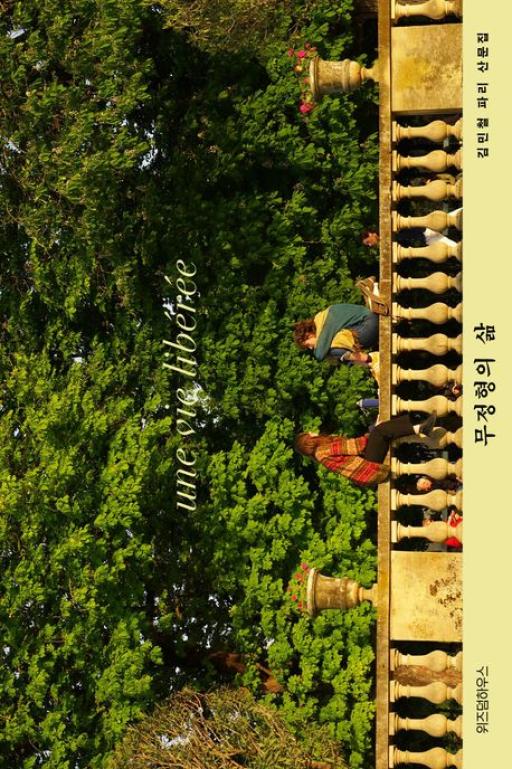독서통신 연수를 여러번 하면서, 항상 뭔가 과제 제출기한에 쫓겨서 마지막에 마무리한 책들이 많았는데, 이 책은 그야말로...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넘긴 유일한 책인 듯 하다. 왜 이 책을 선택했느냐 하면, 15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잊혀지지 않는 파리 15구역 작은 호텔 옆에 위치한 입구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던, 하지만 그 긴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도 잊혀지지 새벽 바게트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주는 갓 구운 빵냄새. 가 지금도 생각나서이기도 하다. 정말 오래되기도 했구나. 여느 개막식과는 다른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파리란 그랬었지, 뭔가 아련하게 매혹적이면서도 내가 그 속에 동화되기는 사뭇 쉽지 않은. 나의 일상과는 너무 다른느낌." 파리란 참 여러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하지만 매일을 살아가는 나와는 참 다른 느낌이기는 하다. 내가 자연스럽게 묻어들어갈 수는 없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 최대한 파리의 수많은, 각자의 사연을 담은 세느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옆에 앉아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쫓기지 않고, 급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의 to do list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열었다.
당연히 파리여행을 해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텐데, 내가 느낀 그 며칠간의 이방인스런 느낌과 작가의 파리에 대한 오랜기간의 열망은 비슷한 느낌인가? 뭔가 시작은 비슷하다. 그런데 내가 10여일간의 파리여행에서 느낀 것과 비슷한 감정들을 작가는 잊지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랜기간의 짝사랑 끝에 실행으로 옮겼다. 내가 20여년간의 쳇바퀴와 같은 회사생활에서,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매일의 일상에서 느낀 것과 비슷한 해방감인 것인가? 분명히 관광객인데 관광객이 아닌, 파리에서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항상 존재하는 두달여간의 머무름. 솔직히 나도 머릿속으로 꿈꿔오기도 했지만, 감히 실행하지 못하는 그것이라 사실 너무너무 부러워서 더 넘기는 것이 겁날 정도라고 해야하나?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다. 나도 똑같이 해보고 싶을까봐 책장을 넘길수록 겁이 나는 느낌.
나도 좋아한다. 그림을 보고 속속들이 알아서, 알고 보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경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내던져져도 좋아서, 그 순간의 내 감정에 따라서 매일매일 다르게 느끼는 대로 느끼기만 해도 되어서, 멍하니 미술관의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이가 한살한살 들수록 신기한 것은, 그때 보았던 나와 지금 보는 내가 달라서 느끼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인데, 그걸 확인하는 순간도 참으로 행복하다. 하지만 또 한편 아쉬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어제보는 감정과 오늘 보는 감정이 다르다는 게 너무나도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인데, 준비하고 준비해서 고작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시간이 10일 남짓인 여행자에게는 그런 여유가 허락될 리가 없다. 결국 또 다른 사람의 관람기를 공유받는 것만으로 충분하게도 끝이다. 동일선상에서 내가 그걸 직접 느껴볼 여유는 없다.
파리란 참 신기한 도시인 것 같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 책에서 파리란 글쓴이의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거리둠, 그래서 새로운 나를 발견함의 배경일 뿐, 사실 그 곳이 파리건, 서울이건, 어느 중동의 도시이건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파리는 많은 여행자들을 매혹하는 많은 이야기를 갖고있는 도시긴 하지만, 애시당초 그곳이 그곳이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듯 하다. 어느 곳이었던간에 순간순간이 빛나고 새로웠을 것이다.
파리의 잊지 못하는 바게트향에 이끌려 이 책을 선택했지만,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같이 향유하고 싶었던 건 반드시 파리의 그것만은 아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경험, 나이지만 또 다른 나를 바라보는 경험, 그리고 그 생각들에 온전히 잠겨보는 경험,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고스란히 의식의 흐름대로 내어맡겨보는 경험, 그것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 여전히 나는 해보지 못하는 일탈이지만 일탈이 아닌 경험. 그래서 마지막장을 덮을 때 매우 아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