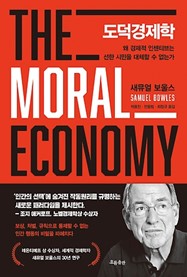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바로 합리성의 가정이다. 경제 주체들은 모두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대부분의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 그런데 이 때 말하는 합리적이라 함은 이른바 자기 이익(self-interest) 중심이다. 즉, 철저하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얼핏 들어보면 매우 그럴듯한 말이다. 쉽게 생각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가정을 반영하듯이,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효용함수의 형태는 경제주체 자신만의 효용함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가정이 의미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른바 후생경제학 제 1정리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효용극대화에 몰두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완전경쟁적인 환경 하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경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외부성과 공공재 이슈 등에서 나타나듯이 시장실패 이슈는 항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생각보다 자신의 이익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도덕 경제학이다. 케잌 나누기 게임을 생각해보자. 이 게임은 2명이서 케잌을 나누는 게임이다. 첫번째 경기자가 자신이 케잌을 얼만큼 가져갈지를 정하면 두번째 경기자는 남은 케잌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 얼핏 생각해보면 첫번째 경기자 입장에서 최선의 전략은 자신이 모든 케잌을 가져가는 것이다. 두번째 경기자는 첫번째 경기자가 가져가는 케잌의 양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첫번째 경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케잌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이 게임은 실제로 게임이론 교과서에도 소개되는 게임이고, 보통 게임이론 교과서에서 첫번째 경기자의 최선의 전략은 케잌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적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모두 케잌을 가져가지 않고 상당한 양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탁아소의 사례도 아주 흥미롭다. 어떤 탁아소에서 아이들의 지각을 방지하고자, 지각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자, 오히려 지각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제학적 분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벌금을 부과하면 자신의 효용이 감소하니, 지각을 안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터인데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달랐다. 오히려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가 지각률이 적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경제학에서 흔히 가정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벌금, 보조금 등으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것 없이도 사람들의 도덕적 감정, 사명감, 정직함 등에 호소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른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여 이기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놓고 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놓고 경제학 모형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현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외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 사명감, 정직함 등도 모형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자가 강조했듯이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구축한 모형들이 오히려 경제 주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협력 체계를 훼손하여 오히려 기존보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 분석에서 그 동안 간과했던 인간의 타인에 대한 감정, 배려심, 도덕성을 경제학의 분석 요소에 포함시켜야 좀 더 현실에 적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아주 쉬운 방법을 생각해보면 효용함수에서 경제주체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효용 형태도 감안하여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