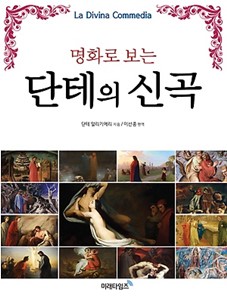단테의 신곡은 단테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주인공으로 하여 시인 베르길리우스, 첫사랑의 연인 베아트리체의 도움과 인도로 지옥,연옥,천국을 차례로 둘러보는 이야기로 채워진다.
단테 일리기에리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1265년에 태어나 1321년에 사망했다. 1296년 5월부터 9월까지는 100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1300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피렌체 통령을 지냈다.
그의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베아트리체의 인연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장이 된 단테가 열살때 처음보고 반해버린 상대가 바로 베아트리체이다. 그러나 부모의 약정으로 서로 다른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9년뒤 단테는 길에서 우연히 베아트리체를 만나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게 된다. 단테는 그 때부터 베아트리체를 위한 사랑의 시를 쓰기 시작했고, 1290년 갑자기 세상을 떠난 베아트리체를 그리며 1295년 시집 새로운 인생을 펴낸다.
지옥은 역피라미드 모습으로 9층의 계단식 모습을 하고 있는데, 베아트리체의 부친이 베아트리체를 돈 많은 금융업자에게 결혼시킨 것을 복수하듯 당시의 부조리와 부패함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실명으로 지옥에서 재현시킨다.
단테의 신곡은 서사시로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은 초보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설명체로 잘 풀어서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제는 "La Divina Commedia" 이다. 유추할 수 있겠지만 Divina는 성스럽다는 뜻이고, Commedia는 희극이라는 뜻이다. 단테는 원래 Commedia로만 제목을 달았는데 1555년 로도비코 돌체 출판업자가 새롭게 책을 내며서 붙인 이름이 지금의 책 이름이 되었고, 신곡이란 한자어는 이 작품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붙여진 번역 제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쓰면서 굳어졌다.
단테가 서사시의 제목을 희극이라 한 이유를 들어보면 희극이란 어떤 추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내용면에서는 즐겁게 끝을 맺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옥에서 출발하여 연옥을 지나 광명의 천국에서 끝을 맺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서른 세편의 절로 이루어져 모두 99개절로 만들어져 있고, 처음 도입부에 하나의 시를 소개하는 절이 있어 총100개의 절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서사시 구도가 아니라 이야기체로 풀어져 있어 그런 문학적인 느낌으로 책을 읽을 수 는 없다.
컬로 들어간 이 책의 명화들은 대부분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과 귀스타브 도레의 판화 그림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화가를 밝히지 않은 다수의 그림들이 같이 삽입되어 이야기의 전개를 돕는다.
아쉬운 점은 명화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단지 이야기 줄거리로서의 보조 역할만 하고 있기에 그 이상의 깊이 있는 접근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명화를 통해 단테의 신곡을 이해하려한다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명화는 철저하게 존재론적인 의미 외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테의 신곡을 당시 시대 화가들의 그림과 함께 보는 것은 책을 읽는 재미의 증가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의 종교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부족한 상상력으로 인해 책을 읽고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장점, 말 그대로 단테에게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안내하는 시인 베리길리우스와 같은 길잡이의 기능도 얻을 수 있다.
온갖 비명으로 가득찬 동굴 속의 죄인들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지옥에 떨어져 신음하는 실존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해지는 형벌들이 정말 적나라 하다. 지옥이 정말 저렇게 되어 있을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했지만 당시의 중세의 사회성과 종교관을 사후세계라는 상상력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단테의 신곡. 현대의 기독교는 연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책에 소개된 중세의 기독교는 개신교와 분리되기 전의 기독교 즉 지금의 카톨릭 교리에 더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