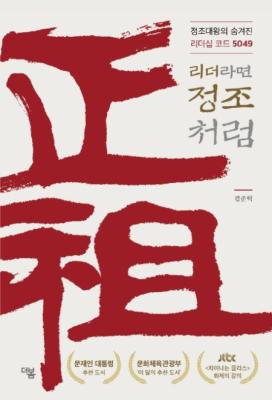정조는 조선조 22대 왕으로 사도세자의 아들이고, 영조의 손자이다. 화성을 건립했고 규장각을 통해 수없이 많은 훌륭한 학자를 배출했으며, 공명정대한 정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군주였다.
이 책은 정조의 정책과 사상을 49개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는 책이다. 그가 50개의 화살을 쏘면 반드시 마지막 화살을 허공으로 날려보냈다는 일화에서 유래하여 49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그의 리더십을 정리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정조는 비극적인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역사에 이름을 남긴 훌륭한 군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후 자산에 대한 반대세력들의 온갖 음모와 폐출위기를 겪었고, 나아가 국왕이 된 이후에도 1777년(정조1) '존현각 시해기도사건'(정유역변) 등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당대 개혁군주로서 한 시대를 이끌고, 우리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은 그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리더십과 정치적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주의 사적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 해도 곧 공적 행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말과 행동에 있어 매사 신중하고, 늘 근엄함을 잃지 않았다. 정조는 신료들에게 늘 '사중지공(私中之公)', '손상익하(損上益下)'를 강조하였다. 사적인 일로부터 시작하지만 반드시 공적인 것으로 연결되도록 강조했고, 윗사람은 덜 가져도 아랫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익을 얻었을 때 함께한 이들에게 고른 분배를 하지 않고 독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조는 소통을 중시했고, 군신공치(君臣共治)를 내세우며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였다. 국왕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공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누구보다 따스하면서도 친인척과 측근들의 잘못은 추상같이 다스리는 위엄도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군주로서 엄청난 양의 정무를 소화하면서도 학문에 소홀하지 않았고, 신체 단련도 충실히 했다. 또한 불교와 도교, 그리고 서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배청하던 시대에 정조는 성리학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은 아니라고 단호히 이야기 하였다. 성리학, 그것도 주자성리학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문난적이라고 배척하고 죽이던 시기에 군사(君師)를 자처했던 조전 역사상 최고의 유학자 군주가 또 다른 사상과 종교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한 정조의 정신은 보다 높은 단계의 실학으로 발전하였고, 정조시대 조선의 문화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길을 나서서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스스로 공부한 의학지식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외세의 침입을 막고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병법과 무예를 익혔다. 이러한 솔선수범과 소통의 리더십은 관료와 양반사대부 그리고 백성들을 감동시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경문화의 시대를 만들어 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뜻이다. 즉 백성은 임금을 떠받들지만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임금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군주민수'의 깊은 뜻을 정확히 이해한 국왕은 동양의 역사에서 종종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정조가 아닐까 한다. 정조는 항상 백성을 물로보고 임금을 배로 보았다. 그래서 정조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이 어느 천은 작인 것이기에 작게 비추고, 어느 강은 큰 것이기에 더 많이 비추어서는 안 된다." 국왕이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에게는 적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조는 국왕이 된지 22년 재인 1798년에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란 자호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만천명월'의 의미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천이 흐르면 달도 흐른다. 천이 멈추면 달도 멈춘다. 천이 고요하면 달도 고요하다. 그러나 천이 소용돌이 치면 달은 이지러진다." 즉 하늘에 있는 밝은 달이 물과 함께 흘러가는데 그 물이 고요할 때는 같이 고요하며 평화롭지만 천이 계곡을 만나거나 불규칙한 지형을 만나 소용돌이 치면 달은 본래의 둥근 모습을 잃어버리고 모나거나 찌그러진 모습으로 제 모습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거센 물결로 배가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군주와 명월, 민수와 만천은 같은 것ㅇ이다 이것이 바로 정조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다.
정조는 인간인 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격한 언어를 쓰기도 했다. 한편으로 노회한 정치가라는 소리도 듣고 보수적인 군주란 소리도 듣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 정조와 견줄 만한 인물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정조의 리더십은 비단 봉건왕조시대에 통용됐던 군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