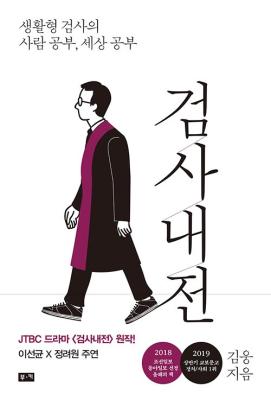소방관, 경찰관, 운전사, 의사, 교사, 검사 중 가장 최근에 생긴 직업은 검사이다. 검사는 불과 200여 년 전에 생긴 직업이다. 영국의 경우 1985년에야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검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신상품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검사 제도가 단기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적합했기 대문이다. 우리나라 검찰에게는 과분한 평가라고 발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토레스가 부진하다고 해도 축구선수가 아닌 것은 아니다. 롯데 팬들이 아무리 "느그가 프로가?"라고 울부짖어도 롯데 자이언츠가 프로야구 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직업이라 그런지 '검사'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념이 '법치주의'다. 간혹 법치주의를 중국의 법가사상과 유사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성적 수준에 비춰볼 때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법치주의는 절대군주의 권력을 견제하여 군주의 자의에 의한 통치를 막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통치하게 하는 사상이다. 이에 반해 법가사상은 절대왕정과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궁극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앞뒤 다 자르고 말하자면 법치주의는 왕권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법가사상은 그 반대로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은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에서나 법가사상에서나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을 신뢰해야 한다. 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하고, 또 두려움을 줘야 한다.
법이 신뢰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흔히 법이 신뢰를 얻는 사례로서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부흥을 이끈 '상앙'의 예를 들곤한다. 남문에 놓인 나무를 옮기는 자에게 상금을 주었다는 상앙의 '이목지신' 고사는 신뢰나 법치주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늘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상앙은 누가 뭐래도 법가사상의 프랜차이즈 스타이다. 농구계의 조던이자 축구계의 펠레와 같은 존재이다.
상앙은 춘추전국시대에 위에서 태어나 위나라 재상 공손좌 밑에서 말직을 맡았다. 공손좌는 상앙의 비범함을 간파하고 위 혜왕에게 그를 중용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죽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항우를 몰락시킨 한신도 범증으로부터 마찬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중용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죽여야 할 인물'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이 뛰어난 캐릭터에 붙이는 진부한 수사가 아닌가 싶다. 민족적 성품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다.
아무튼 상앙은 위나라에서 출세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지 '초현령'을 내려 각지의 인재를 구하고 있던 진나라로 떠났다. 진나라로 가서 권세가였던 경감의 추천을 받아 진 효공을 만난 그는 세 번째 만남 끝에 법가사상을 설파하며 중용된다. 그리고 후일 결국 상앙은 진나라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까지 오른다.
외국인인 상앙이 진나라 최고 지위에까지 오른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당시 진나라에는 외국인르 꺼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진나라에서 외국인 관료들을 추방하자는 내용의 '축객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축객령'에 대항하여 이사가 내세운 논리가 바로 '바다는 한 줄기의 개울도 마다하지 않고,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축객령에서 보듯 진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찮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외국인을 등용한 것은 지도자의 용병술이다. 결국 진나라를 부흥시킨 것은 상앙이 아니라 상앙 같은 인재를 알아보고 추천한 경감과 그를 등용한 효공이라고 할 수 있다. 상앙 같은 인재는 어디든 있으나 그런 인재를 알아보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당시 진나라는 후발주자였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했고, 잠재력이 현실적인 힘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외국에서 인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