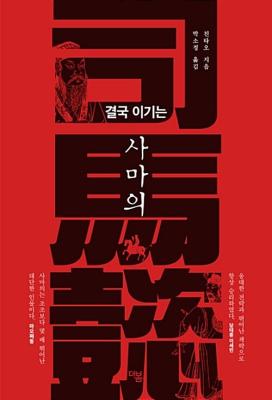우선, 이 책은 삼국지와는 다르게 사마의 중심의 시각에 접근한 책으로 당시의 걸출한 인재들속에서 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었다.
사마의라는 특출난 인재가 만들어가는 역사의 여러 장면들을 볼 수 있었고 평범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수완과 개인적 세계관에 의하여 결국 한 나라의 운명과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구나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중국의 기나긴 역사에서 망하는 나라의 상황은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부적절한 지도자의 처신 등 대부분 대동소이하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사마의에 의해 기초되어지고 사마씨에 의한 서진의 발생도 어리석은 후손들에 의해 어지렵혀지고 망해가고 새로운 주인공들이 들어선다는 교훈은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과정이라고나 할까.
대부분의 역사의 현장, 요동치고 회홀이치는 정국속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인물과 함께하면서 역사적 주인공이 될 것인지
후세의 후손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역적이 될지는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으로 당시 상황하에서 그사람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였는 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대표인물인 신숙주의 선택들이 역사적으로 일부 각인된 변절자 이었는가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냐는 물음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유명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긴다는 말을 귀 닳게 들었고 그동안 읽었던 소설의 선입관 때문에 조조 진영은 나쁜 사람들로서 인식되면서
사마의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공명을 저지한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삼국지에서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책을 읽으면서 한나라 황실 후예인 유비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다. 따라서, 매우 인덕이 높은 지도자로서의 유비, 상대적으로 비수와 음모에 능한 지도자로서의 조조로 인식되어 왔기에 유비가 삼국통일을 하지 못 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로 책이 맺어지면서 흥미있는 느낌으로 가슴에 남아 있다.
사마의 편에서 볼때 실제로 조조는 비열한 지도자가 아닐 수 있고, 나약한 한나라 황실을 페하기 위한 시대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당시대의 뛰어난 인재였던 공명에게는 이길수는 없었지만, 사마의는 공명이 있어야 오히려 자신의 가치가 빛난다라는 본인의 고단수 술책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의 실력을 믿고 충언을 마다하지 않다가 자결한 순욱에 비하여 조조와 그 후손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시대를 기다리는 인물이었던 사마의, 일본 소설 대망에서도 보시다시피 덕천가강이 그 많은 시간들을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면 자신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조조 등에 이어진 사마의 말년의 조방 황제에 이르러 젊은 피 조상이 사마의를 견제하면서 실권을 장악하자 병을 핑계로 낙향했을 때 사마의의 나이 칠십이었고, 사마의가 사라지자 마음껏 패권을 휘두르던 조상이 참모의 권고에 따라 혹시나 싶어 심복 이승을 인사차 보내 사마의 동정을 염탐하게 했지만 이미 조상의 의도를 간파했던 사마의는 이승 앞에서 손을 떨어 약사발을 흘리고 귀머거리 행세를 했다.
병이 깊이 들고, 치매도 있다는 등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심복 이승의 보고를 받은 조상이 사마의에 속아 황제 조방을 모시고 황궁을 벗어나 고평릉에 제사를 지내러 간 것이 중대한 실착이었다.
죽은 듯 조용하게 지내던 사마의가 이때다 싶어 은밀히 관리하여 왔던 아들 사마소 등의 군사들을 소집해 일거에 황궁과 위나라를 실질적으로 접수하게 되었고, 손자 사마염에 이르러 결국 위나라를 폐하고 진나라를 세우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책에서 보듯이 고희의 늙은 사마의가 결정적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서두르지 않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기존의 삼국지를 읽을면서 유비, 조조, 손권, 제갈량, 조자룡, 관우, 장비, 여포, 황충, 마초, 주유, 육손 등등 기라성 같은 영웅호걸들의 지혜, 전략, 의리, 활극도 구미가 당기지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인내와 대기만성의 이치를 사마의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책에 의하면 사마의에 대해 마오쩌뚱, 당태종 이세민 등도 사마의를 역시 웅대한 전략과 뛰어난 책략으로 항상 승리한 인물로 평가했다고
하니, 조조와 후손들을 철저히 속이고 제갈량을 성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후의 승자가 된 사마의의 인생과 처세술이 중요한 핵심이었다.
다른면에서 개인적인 권력욕에 끝까지 권모술수에 능했던 사마의에 대해 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의 의도는 통일 권력 쟁탈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접근하였다고 할 수도 있고 ,
결국 패자보다는 승자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