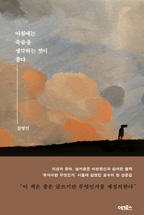이 책의 제목 만큼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또 있을까? 아침. 우리는 해가 뜨는 아침에 대부분 희망을 노래한다. 한데, 이 책은 제목부터 아침에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죽음이란 흔히 절망을 의미하여 서로 이야기하기 꺼리는 단어임에도 말이다. 아침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단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아침부터 절망하고 있으란 말인가? 어쩌라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가 말하는 죽음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단편적인 절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 그 자체보다 인생이란 한번은 죽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 죽음이란 인생에서 꼭 오는 일인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점이 관전포인트인 것 같다. 그래서 저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면 영원히 살 것처럼 굴기를 멈출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또 어려운 시절이 오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닫아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는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저자만의 색다른 경험인 것 같다. 하지만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다. 유한한 삶 그리고 그 유한의 정점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인정한다면 삶을 진짜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저자는 아침을 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여러가지 이유를 나열한다. 첫째, 이미 죽어 있다면 제때 문상을 할 수 있고 둘째, 죽음이 오는 중이라면 죽음과 대면하여 놀라지 않을 수 있으며 셋째, 죽음이 아직 오지 않는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보다 성심껏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넷째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가짜 희망에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섯째, 공포와 허무를 떨치기 위해 사람들이 과장된 행동에 나설 때 상대적으로 침착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침착함을 가지고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생과 이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일상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영화에서 대화에서 느낀 이야기를 담은 이 책에서 저자의 관점은 보통의 시각과 반대일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과 일이 이렇게도 얘기될 수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되고 정반대의 견해도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오늘 하루의 시간에 대해 말할 때 오늘 이시간은 누군가 살기 싶어 몸부림친 하루다 라는 표현을 듣곤 한다. 그러나 저자는 OECD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거론하며 오늘 하루를 누군가 살고 싶지 않아 몸부림친 하루다 라고 표현한다. 이 책에는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정반대 다른 관점의 역설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 독자의 고정관념을 건드리며 당연시 여겼던 것에 반기를 들고 한번 더 생각하게 해준다. 이를테면 행복은 불행을 가져오고 성장은 죽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행복의 계획은 인간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행복의 계획이 되레 불행을 가져다 준다니? 행복이란 온천물에 들어갈 후 10초 같은 것이어서 그러한 느낌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을 바라다보면 그 덧없음으로 쉽게 불행해지는데 그래서 저자는 차라리 소소한 근심을 누리며 살고 싶단다. '왜 만화 연재가 늦어지는 거지' '왜 디저트가 맛이 없는 거지' 같은 근심을 누린다는 것은 이 근심을 압도할 큰 근심이 없다는 것이며 이 작은 근심들을 통해서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장에 대하여도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상처입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주변 사람의 죽음을 알게 된다.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되는 이러한 성장 과정은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확장된 시야는 삶을 관조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관조 속에서 상처입은 삶조차 비로소 심미적인 향유의 대상이 된다. 이 아름다움의 향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시야의 확대와 상처의 존재다.' 시야의 확대가 따르지 않는 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고 말한다. 태어난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과정에서 상처는 불가피한 것. 제대로 된 성장은 보다 넓은 시야와 거리를 선물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