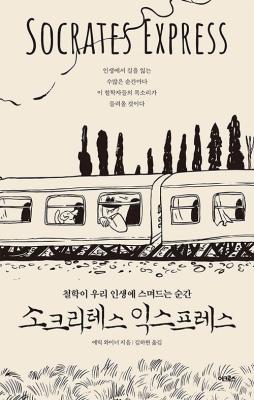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혜를 원한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정보는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고, 지식은 뒤죽박죽 섞인 사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혜는 뒤얽힌 사실들을 풀어내어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식은 토마토가 과일임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과일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지 않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식이 늘면 오히려 덜 지혜로워질 수도 있다. 앎이 지나질 추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다.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는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를 운으로 얻으려는 것은 바이올린을 운으로 배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지혜의 부스러기를 줍기를 바라면서 비틀비틀 인생을 살아나간다. 그러면서 혼동한다. 시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이 많은 것을 생각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며, 인기가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나도 거의 언제나 배가 고프다. 내 생각엔, 기억 내내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닌 우울 때문인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허기를 채워보려 했다.전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배고픔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
영어의 철학자라는 단어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필로소포스에서 왔다. 하지만 미국 독립선언문이 행복을 손에 넣는 것에 관한 글이 아니듯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 역시 지혜를 소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행위 그 자체다.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철학을 근본적 반성이라고 불렀다. 메를로퐁티가 철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약간의 통렬함과 위기의식을 불어 넣었다는 것이 마음에 든다. 한때 철학자들은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따. 철학자들은 영웅이었다. 그들은 자기 철학을 위해 죽을 의향이 있었고, 소크라테스 같은 몇몇 철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제 철학의 영웅적인 면은 대학의 종신 재직권을 따내려는 투쟁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요즘 젣로 존중받지 못하는 단어다. 어떻게를 알려주는 실용서는 출판계의 망신거리로 마치 크게 성공했지만 무례한 사촌과 비슷하다. 진지한 작가들은 실용서를 쓰지 않고, 진지한 독자들은 실용서를 읽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실재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가 존재할까를 고민하며 밤늦게까지 잠 못들지 안흔다.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처럼 어떻게를 묻는 질문이다.
과학과 달리 철학은 규범적이다. 철학은 세상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까지 말해준다. 작가 대니얼 클라인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에게 다음과 같은 최고의 찬사를 던졌다. 에피쿠로스를 철학이라기보단 삶을 고양시키는 시 라고 생각하고 읽을 것
우리에겐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 열다섯 살에게 중요한 어떻게 질문과 서른다섯 살, 또는 일흔다섯 살에게 중요한 질문은 같지 않다. 철학은 각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 단계들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의 시간을 전부 가진 양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하찮고 바보 같은 것들로 머릿속을 채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결국 인생은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든다. 나는 그 말을 보고 생각한다. 왜 기다려야 하지? 왜 삶이 골칫거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오늘 바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때 인생이 이끄는 대로 나도 철학자가 되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