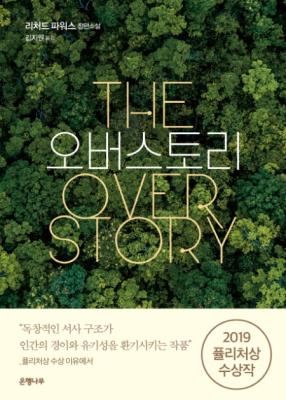이 책은 빌 게이츠씨가 올해 여름에 추천한 다섯 권중 하나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 채 골랐다. 책을 받아보니 쪽수가 700여쪽인 것에 상당히 당황했다. 책을 펼쳐 목차를 보니 뿌리, 몸통, 수관, 종자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뿌리의 하위 목록에 8명의 등장인물이 한 장씩 차지하고 있다.
이 책의 초반부에 인물에 대한 소개 및 사건, 배경을 설명하는 접근방식은 20여년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의 초반부를 읽었을 때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이 책이 훨씬 더 흥미롭다. 작가의 각 인물과 가족들에 대한 묘사가 재미있고 각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들도 특이하다. 작가가 인물을 소개하면서 미국 역사를 군데 군데 슬며시 풀어 놓고 있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았다. 또한 최근 과학에 대한 내용도 인물을 통해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하여 작가의 다방면에 걸친 박식함에 많이 놀랐다.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주요 소재이자 주제인 나무에 대한 작가의 묘사 및 설명 역시 탁월하다. 내가 얼마나 식물에 대해 무지했고 둔감했었는지 새삼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주요 인물이 말하는 내용에서도 나무 및 숲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상당히 많이 알게 된다. 현재기준으로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 등장하지 않고 최근 삼백여년간 그 존재감을 드러낸 미국이라서 그런지 미국에 그렇게 큰 나무와 거대한 숲들이 있었는지 이번에 새로 알게 되기도 했다.
작가의 이야기하는 방식도 상당히 독특하다. 책 목록도 특이하지만, 700여쪽에 걸쳐 화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미래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느낌도 들게 하는 장면이 많았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형으로 사건을 기술하여 가끔 내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헷갈리기도 하였다. 또한 작가가 사건을 전개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책의 저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쓱 끄집어 내어 작가가 마치 나의 기억력 및 집중력을 시험하는 느낌도 들었다. 사실, 700여쪽을 한 달여만에 다 읽었다는 사실만이 나를 뿌듯하게 할 뿐, 한 두 번 더 읽어야 이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지금도 몇 가지 이해가 확실하게 안 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패트리샤 웨스터퍼드가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강연에서 강연을 다 한 후 마신 것의 의도와 그 결과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또한 더글러스 파블리첵이 책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왜 20여년전 함께 했던 사람들 중 하나인 애덤 어피치를 왜 배신하게 됐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각 인물들에 대한 소개 및 에피소드가 분명히 중후반에 몰아치는 사건들과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책을 읽고 있던 시점에서는 200. 300. 400, 500 페이지 앞의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언젠가 다시 한 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가 상당히 독특한 인물들을 데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사건들을 이끌어 가면서 결국 독자에게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현재 인간이 자연을 이용 혹은 훼손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무들에게 더 나아가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같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현재는 어디쯤에 있는지 비유를 든 장면이 있다. 이것은 Attenborough경이 예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책에서 묘사한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해부학적으로 현대 인간은 자정이 되기 4초전에 나타납니다. 최조의 동굴 벽화가 3초 후에 생기지요. 그리고 큰 바늘이 자정에 도착하기 천분의 1초 전에 생명이 DNA의 미스터리를 풀고 스스로 생명의 나무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정에, 지구의 대부분의 지역이 한 생물종을 보살피고 먹이기 위한 줄뿌림 작물 천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생명의 나무가 다시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바로 그 때 그 거대한 나무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수십억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나타난 인류가 나타나자마자 스스로 그 진화의 역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고 경각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