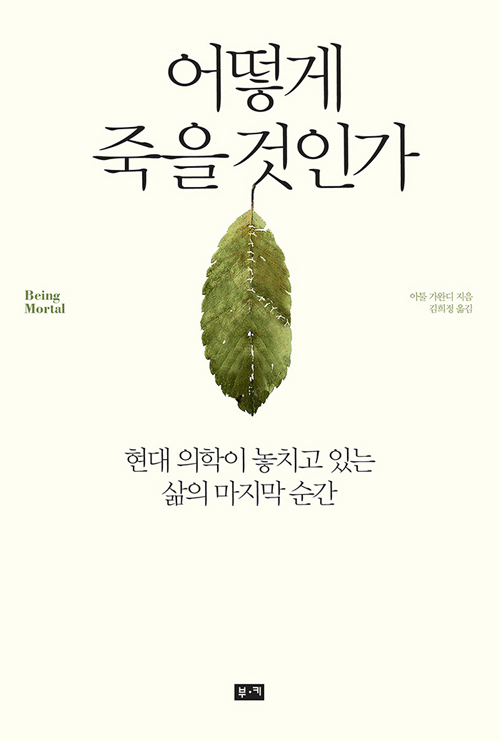어떻게 죽을 것인가,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제목을 보고 선뜻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라는 작은 의문을 갖고부터 이런 책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의대 교육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지 꺼져가는 생명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데
있지 않다. 톨스토이의 고전 중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에서 이반 일리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죽어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아플 뿐이며, 잠자코 치료를 받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여기게 하는 것은 기만과 거짓이라
여겼다. 의사, 친구, 가족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그가 원하는 만큼 동정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통증을 겪고 난 후에 그가 가장 원했던 건 (그 사실을 고백하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사람들이 아픈 아이에게 그러듯이 자기를 동정해 주는 것이었다. 누군가 다독거리면서 안심시켜 주기를 갈망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라자로프는 "그래서 날 포기하겠다는 거냐?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지" 라며 고집을 부리며 수술을 선택했다.
그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수술에 따르는 위험 때문이 아니라 수술을 받아도 그가 원하는 삶을 되찾을 확률이
없었다. 배변 능력, 활력 등 병이 악화되기 전에 누렸던 생활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길고도 끔찍한 죽음을 경험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추구한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현대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환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육체적 고문을 가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나이 들고 병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삶에는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이다.
노인들이 예전에 누렸던 지식과 지혜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도 문자의 발명에서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졌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직업을 낳았고, 새로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오랜 경험과 노련한 판단의 가치가 훨씬 퇴색되어 버렸음은 물론이다.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의지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구글 검색을 하고,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전통적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나이 어린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안정감, 조언, 경제적 보호 등을 제공하는 원천이 됐었는데 말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 즉 노화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품이 노쇠해진다는 의미다.
모든 것은 결국 허물어지게 마련이다. 증세가 나빠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 병이 진전되고 기관 손상이
더 심해지면 작은 문제를 견뎌 내는 힘마저 없어진다. 마지막 단계는 항상 내리막길이고, 결국은 더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시점이 오고 만다. 노령은 진단명이 아니다. 사망진단서에는 항상 호흡부전, 심장마비 등의 사인이 들어가게
마련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병으로 죽음에 이르는게 아니다. 의학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여기저기 보수하고 기워 가며
유지를 하다가 신체 기능이 종합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1954년에 의회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지을 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현대 요양원의 시초였다. 노령에 접어들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병실을 비우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nursing home' 즉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어시스티드 리빙'이라는 개념, 즉 일상적인 삶을 돕는 일의 성공 여부를 잴 수 있는 척도가 없다는 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평가 기준이 있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기댈수 있는 대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노인이 선택한 방식
으로 살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돕는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통제와 감독이 계속되는 시설에
갇혀 사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