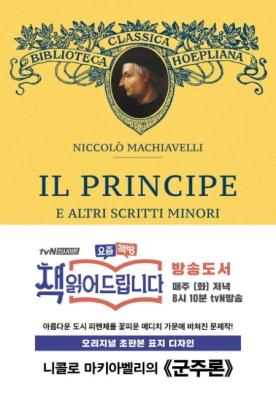유력인사가 손바닥에 한자를 새긴 것을 두고 요새 때아닌 황당함에 이슈가 되고 있다. 현대에서 대통령이란 과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왕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국민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며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가운데, 이 와중에 지금으로 부터 490년 전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지은 군주론을 읽고 있는 현재 나의 모습 또한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대충 읽은 것이 아니라 밑줄을 긁어가며 읽게 되었다.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올린 헌사를 보면 '신분이 낮고 비천한 자가 감히 군주의 통치를 논하고, 그와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주제넘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경을 그리려는 사람이라면 응당 산맥과 다른 높은 고지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가고, 평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성의 성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되어야만 하고, 군주의 본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무릎을 치게 만드는 구절이었다. 군주론의 내용들은 현실적인 내용들이었다. 사람을 다룰 때에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다정하게 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ㄴ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쉽게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를 주어야 한다면 복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예 확실히 주어야 한다는 구절에서는 헐 싶었다. 위인들은 기회를 이용할 줄 알고 자신들의 국가가 영광을 누리고 크게 번영하도록 이끌어 주고, 권력을 얻기까지는 시련을 겪지만, 일단 권력을 쥐면 어려움 없이 성공한 지도자로 남게 된다고 까지 충고해 준다. 군주는 다른 모든 나쁜 결과는 차지하고라도 무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경멸 당한다. 예견되어지는 용병의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야 하므로 자국군, 자신의 군대를 키워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시기에 군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평소에 신체를 단련하는 한편 자연지형을 익혀야 한다.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의 지형을 잘 알게 되므로 어떻게 방어할 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고, 지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접하는 지역의 새로운 지형의 특징도 쉽게 파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군주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뭘 하겠다고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중립은 적을 만든다. 승자는 자기가 곤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자를 동맹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패자는 그 군주가 자신에게 군사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공동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호의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도와준 군주가 패했더라도 그는 당신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며, 감사를 표할 것이고, 힘이 남아 있는 한 당신을 도우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운명을 함께 개척해 갈 동맹이 되는 것이다. 군주는 능력있는 자를 우대해야 하며 백성들과 신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부과될 세금이 두려워 재산 늘리기를 주저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해야하고, 오히려 군주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시와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운명의 반은 인간이 좌우한다. 운명의 여신이 격렬하게 넘실대는 험난한 강 처럼 덥쳐도 사람들이 평온한 시기에 제방과 둑을 쌓아 예방 조치를 미리 취한다면 물이 제방을 넘어 통제할 수 없어져도 피해가 덜 가도록 할 수는 있다. 운명은 자신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드러내며 운명을 막기 위한 제방이나 둑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 집중해서 덮치는 것이다. 또한 운명을 손아귀에 넣고 싶다면 거칠게 과감하게 공격적이며 대담하게 다루어야 한다. 내정하게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보다 운명은 그 반대의 사람에게 끌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