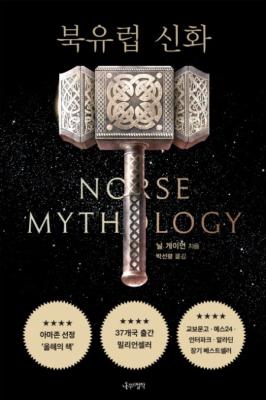아무래도 북유럽 신화라고 하면 낯설다. 리스, 로마 신화가 가지는 위상과 우리나라에서의 관심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위상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모든 신화가 가지는 보편성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북유럽 신화만의 특수성은 어떤 것인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북유럽 신화의 신인 토르가 마블 시리즈에 등장하는 것 등을 보듯이 현대 서구 문화의 소재가 되어가고 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안인희가 쓴 《북유럽 신화》에서 1권은 전 세계 모든 신화가 그렇듯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신화에서 중심이 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오딘과 토르와 같은 들어봤던 신이 등장한다. 오딘(Odin)은 북유럽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보단(Wodan), 보탄(Wotan)으로도 불렸는데 영어에서 수요일(Wednesday)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토르(Thor)는 오딘의 자식으로 농업의 신이자 천둥의 신인데, 목요일(Thursday)가 그 이름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이것만 봐도 유럽의 문화에 북유럽 신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영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1권에서 북유럽 신화에 대해 특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은, 신화의 신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신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불완벽함이란 주로 정신적인 면인데 반해, 북유럽 신화에서는 신체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신들이 등장한다. 우선은 최고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오딘은 애꾸눈이다. 지혜를 얻기 위해 한쪽 눈을 아낌없이 뽑아버렸다. 로키라는 신은 말썽장이로 온갖 문제를 일으키며 다니고, 가장 지혜로운 거인은 아예 몸을 잃어버리고 머리만 남았다. 토르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쇠망치 묠니르는 난쟁이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로키가 훼방을 놓는 바람에 손잡이가 너무 짧게 만들어졌다. 그런 불완전한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갔다는 상상력은 세상에 대해 (그 신화를 만들어낸)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 인상 깊은 점은 신들이 한 약속에 얽매이는 모습이다.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약속이더라도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세계가 그들의 세계다. 오딘부터 그랬다. 최고의 신이지만 자신이 만든 세계의 질서와 계약에 구속되고 복종하였다. 역시 그런 신들의 세계를 만들어낸 이들이 상상한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다. 다툼이 빈번했고, 어지러운 세상이었지만 그들이 바란 세상은 한번 내뱉은 약속쯤은 지켜야 하고, 그 규칙 아래에서 당당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신화는 사람들이 살았던 세계와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이야기한다. 토르가 그토록 격렬하게 싸웠던 대상은 (마블 영화에서도 그렇듯이) 인간을 괴롭히는 온갖 거인들이었다. 그 거인들은 바로 북유럽에 살았던 이들이 이겨내야 했던 혹독한 자연 환경을 상징하고 있다. 사나운 추위의 겨울을 상징하는 서리거인, 거친 산악지대를 상징하는 산악거인,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험한 바다를 상징하는 얼음바다거인. 북유럽인은 바로 그런 거친 자연 환경을 이겨내야 했으며, 그 역경과 바람을 바로 토르라는 신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화를 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출처] 오딘과 토르를 만나다 - 안인희의 북유럽 신화 1|작성자 에나
라그나뢰크로 최후의 전쟁까지 치르고, 이후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음을 보여줬는데 3권에서는 무슨 얘기가 남았을까 궁금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1권, 2권은 거의 신들과 거인들의 이야기였다. 북유럽 신화가 상정하고 있는 아홉 계의 세계에서 하나 차지하고 있는 인간들의 세계, 즉 중간계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다. 3권은 그 인간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인간들의 이야기라면 신화가 아닐 터, 바로 영웅들이 3권의 주인공이다.
어디서나 영웅들의 모험담을 읽으면 신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불만스럽기도 하다. 북유럽 신화에서도 당연히 그렇다. 이를테면 ‘반지의 영웅’ 지구르트만 해도, 난쟁이 밑에서 자라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온갖 모험을 겪다, 잠자는 숲 속의 미녀를 깨워 사랑하고,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읽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지만, 그 주변의 인물들은 오로지 그의 영웅됨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모든 영웅담은 그런 구조다. 그건 영화를 비롯한 영웅 이야기에서도 그렇다. 그런 구조라 환호를 받고, 또 비판을 받는다. 상징 속에 교훈이 담겨져 있고, 반복되어 읽히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히는 것은 신화의 교육적 요소이긴 하지만, 그와 함께 영웅 중심의 서사가 가지는 반교육적 요소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런 평론가적인 시각을 거두고도 북유럽 신화의 영웅 이야기를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잘은 몰랐지만, 이름은 들어본 영웅들이 등장한다. 1권, 2권에서 소개했던 지구르트가 있고(사실 2권 이야기의 반복이다), 베오울프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영웅인 ‘성배의 기사’ 파르치팔과 ‘백조의 기사’ 로엔그린이 있고, 열렬한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도 있다(사실 3권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전부이기도 하다).
이렇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왜 이들의 이야기가 현대에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그들의 모험은 화려하다. 용이 등장하고(동양의 용과는 달리 서양의 용은 거의 ‘악(惡)’의 상징이다), 공주를 둘러싼 기사 사시의 대결이 있고, 기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좌충우돌의 측면이 있고, 이유도 매우 단순하지만(아버지의 복수, 아니면 그냥 기사라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더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다. 지구르트의 반지만 하더라도 현대의 영상 문화에서 ‘반지’가 등장하는 다양한 예들을 보면 모두 거기서 분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는 성장 소설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 가장 뚜렷한 것은 파르치팔이다. 위대한 기사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세상과 단절시켜 키운 탓에 바보 소년으로 자란 게 파르치팔이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한 동경은 본능과 같은 것이었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는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에, 여자로부터 물건을 빼앗고, 기사와 싸우고, 불쌍한 사람 앞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질문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잘못을 깨닫고, 당당한 ‘성배의 기사’, ‘성배의 왕’이 된다. 이런 성장 이야기는 사실 모든 영웅 이야기의 표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다. 그렇다고 시시하다고 물려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란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많은 문화에 이런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이야기의 다양한 유용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다양한 유용성 가운데 으뜸은 물론 재미다. 북유럽 신화의 영웅들의 이야기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