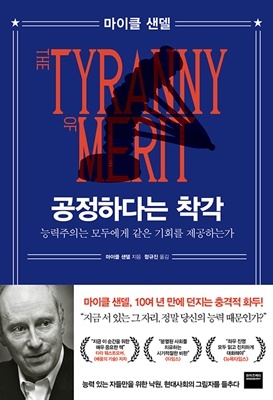현대 민주주의사회(사회주의체제 또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부의 양극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이후 각국정부가 위기대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면서 그 증상은 악화되어가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왜 세상은 자진자가 더 가져가고 못가진 사람들은 소득의 정체 내지 하락으로 빈곤이 심화되어 가는가?
본인이 취업을 할 때인 1992년만 해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뤄 아이들 키우고.. 이러한 일들이 보통사람이 살아가는모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해서도갖가지 스펙쌓기를 하지만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린 세상이다. 그런 와중에 부모찬스 등등 불공정한 얘기들이 나오면 사회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까지 있는게 서글퍼짐을 느끼게 한다.
작가인 마이클 샌델은 본 저서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는 능력주의 신화에 주목한다. 이 명제들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테마인데 이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능력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허점도 있다. 공평한 기회제공과 능력발휘의 보장장치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통제하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실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가진 장점의 시효는 다했다고 분석한다. 부유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더 풍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부유한 부모들이 명문대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한 대학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기여금 입학 등의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애초부터 기회의 공평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정한 능력주의 제도를 마련하자', '사회적 위치가 재능과 노력을 반영하게 하자'며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또는 실패)을 해석하는 방식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 재능과 노력을 보상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건, 승자들이 승리를 오직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그리고 그보다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깔보도록 한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일자리가 없거나 적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나의 실패는 자업자득이다.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헤어나기 힘든 좌절감을 준다. 이로 인한 포퓰리즘의 반격으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브렉시트가 가결되고 외국인혐오증, 인종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적대감 등 기존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는 현상들이 전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자유무역협정, 금융규제 철폐를 비롯한 재화, 자본, 사람의 국가 간 흐름을 쉽게하는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경제의 금융화 진전으로 실물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금융계 자체에게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을 훨씬 더 많이 창출하는 금융화는 일의 존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자들의 사기저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시장주도적 세계화와 능력주의적 성공관은 우리가 동료 시민들에게 덜 의존적이 되고, 서로의 일에 덜 감사하게 되고,연대하자는 주장에 덜 호응하게 되도록 했다. 능력주의적 인재선별은 우리 성공은 오로지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잃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유대관계의 상실로 빚어진 분노의 회오리 속에 있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의 시대가 풀어버린 사회적 연대의 끈을 다시 매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일지 모르지만 각자의 삶을 대하는데 있어 주어진 여건속에서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어느 시점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잡을수도 있기에 사회를, 부모를 탓하기에 앞서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는 정신으로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