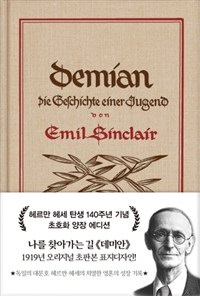이 작품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한 청춘의 고독하고 힘든 내면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 이라는 것은 사실 좀 뜬 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사실 아주 오래 전 아주 오래 전 학창시절에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나 자신인데,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굳이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별다른 감흥 없이 읽었던 것 같다.
나는 청소년 기에 거의 대부분의 고전 작품을 읽었으므로 이 작품 역시 그 당시에 읽었었다.
이 작품은 명성에 걸 맞는 감동을 내게 안겨주지 않았고, 단지, 엄청난 두께와 행갈이 없이 이어지는 만연체의 빡빡한 분량을 자랑하는 여타의 고전들과 달리 이 작품은 두께가 얇아 덜 부담스러웠던 정도라고 생각했던 정도였다. 읽으면서 역시 고전은 두꺼우나, 얇으나 비슷하다고 치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만난 <데미안>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내게 다가왔다.
싱클레어에게 성서 속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선악의 진실에 대해 가르쳐준 데미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하에 누렸던 안전한 생활을 벗어나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 성장하게 되는 싱클레어도 뭔가 익숙하게 공감되는 지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인물들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유년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된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풍기는 집을 벗어나 어른이 되어 가는 순간,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끝나는 순간이란 누구에게나 통과의례처럼 다가오게 마련이다.
누구나 데미안처럼 엄청난 혼란에 빠져 온갖 격정과 감정의 분출들로 괴로워하던 시기를 거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물론 어른이 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싱클레어가 그랬듯이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야 그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제대로 느끼지도, 판단하지도 못하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는 말이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이라는 존재를 만나 비로소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가 아니며, 세상은 얼마든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고,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알을 깨고자 할 것이다. 내가 십대에서 이십 대로 넘어갈 때, 그때 해야만 했던 고민들에 빠져 밤을 지새웠듯, 지금도 그러한 것이다.
흔들림과 안정감, 선과 악, 강함과 약함. 우리는 이 양극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며 평생 알을 깨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해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또 다시 깨트리며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생각으로 지새운 수많은 새벽들이 언젠가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내면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카인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반대로 설명한거야. '표식을 지닌 자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표식을 지닌 자들은 불길해서'라고 말이야. 사실 틀린말도 아니야.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들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보상받으려고 그럴듯한 별명과 전설을 붙여서 복수한 거야. [p 42-43]
*네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사대방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해 봐. 그때 상대가 전혀 불편해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단념하는 게 좋아.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어 낼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지. 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명밖에 보지 못했어. [p79-80]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당시의 내가 여전히 알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알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온 상태라고 자신있게 말할 자신은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깨뜨려야 할 세계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성공 이외의 것은 실패라는 단어로 이단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결과야 어떻든 어떤 점에서는 그러한 길에 적응하려는 것이 더욱 편할 수도 있다. 굳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민하느니 현실에 정진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알 속에서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그러한 편안함이 다른 세계에 대한 무지 내지는 무시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한번쯤 생각해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