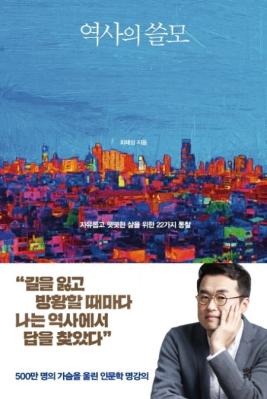이 책은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역사는 왜 배우는가?’에 대한 지은이가 던지는 화두에서 비롯된 지은이가 찾은 해답 중의 몇 개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은이는 “역사를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왜’라고 묻고, 그 시대 사람과 가슴으로 대화하며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삶이라는 문제에 역사보다 완벽한 해설서는 없다”
역사는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준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역사의 인물과 그 결과는 무수히 반복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책의 제목도 ‘역사의 쓸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에게 다가가 ‘왜’라고 묻고, 가슴으로 대화해보면 현재 내가 직면한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 중 이육사 시인과 이순신 장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다고 하는군요. 바로 ‘오히려’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힌 열혈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수인번호 264를 필명으로 삼을 정도죠. 무장 독립단체인 의열단의 단원으로 조국 해방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온전히 바친 분입니다.
이육사 선생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동방은 하늘로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순신 장군도 그렇습니다. 조선 해군이 일본에 참패하면서 배가 달랑 12척밖에 없었을 때 선조는 수군을 해산할 테니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명을 받습니다. 이때 선조에게 올린 장계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처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두 분 모두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히려’라는 무한 긍정의 낱말을 떠올리며 힘을 줍니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정사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비해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야사에 속합니다. 지은이는 여기에서 먼저 역사의 쓸모를 찾습니다. 유사遺事란 ‘버려진 것들을 모은 역사’라는 뜻입니다. 일연스님은 이 책을 쓰기 위해 청년 시절부터 사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전설, 민담 등을 말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는 <그리스․로마신화>와 닮아 있고, 안데르센 동화와도 닮아 있답니다. 이런 야사를 가진 나라들에 비해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너무 경직된 사고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자로 기록하기 쉽지 않던 고대에는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었잖아요.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화 또한 역사의 한 조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지은이는 일연 스님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이야기들을 주워 잘 펴서 우리에게 남겨준 분으로 이야기하네요.
제2장. 역사가 내게 가러쳐준 것들
이 장에서는 협상의 달인에 관한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서희가 재상으로 있을 때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맺고 거란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거란의 장군 소손녕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요.
서희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소손녕이 국경을 넘자마자 고구려 옛 땅을 요구하면서 강화를 먼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숨긴 패를 보여주지 않는 탐색전이 계속됩니다. 그런 와중에 거란은 슬쩍 진짜 패를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왜 너희는 송나라만 친하게 지내느냐는 거죠. 서희는 바로 간파합니다. 송나라와 일전을 계획하고 있는 거란으로서는 고려는 후방이 되어 두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을요.
서희는 제안합니다. 거란과의 사이에 여진족이 다스리고 있어서 거란과의 교류가 힘들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든지 거란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란과 고려의 관계에서 뜬금없이 제3자가 화두가 된 것이죠.
거란은 덥석 그 제안을 물었습니다. 덕분에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는 고려의 땅이 됩니다. 이 회담에서 두 나라는 모두 승리자가 된 셈입니다.
이 교훈에 대해 중국과의 갈등을 겪은 사드문제 이야기도 뒤따릅니다. 사드문제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입장이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화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화를 불러왔죠.
그러고 보니 NCND 기조를 유지했더라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은 물론 두 강대국에게 일부 공을 돌리는 전략이 유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장.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는 정도전, 김육, 장보고,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제 때 판사를 포기하고 쌀가게를 연 박상진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네요. 당시 피고인은 일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었겠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영웅인데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는 나중에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일제타도를 위해 앞장섭니다.
4장에 나오는 경주 최부자댁 이야기를 듣노라면 언제나 감동입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무려 200여 년 동안 12대에 걸쳐 만석꾼의 지위를 유지했으니 그 자체로도 흥미 있는 이야기죠.
그 집에 들를 기회가 생기면 현판을 꼭 봐야겠어요. ‘대우헌大愚軒’, 바로 ‘큰 바보가 사는 집’이라는 뜻이죠. 또 다른 현판엔 ‘둔차鈍次’, 즉 ‘재주가 둔하여 으뜸가지 못하고 버금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거죠.
이 집의 또 다른 비결인 가훈이 있습니다.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역에서 사람이 굶어 죽으면 부자인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로 손색이 없습니다.
19세기 민란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공격했을 때 오히려 최부자댁은 주변 이웃들의 보호를 받았다죠.
“삶이라는 문제에 역사보다 완벽한 해설서는 없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