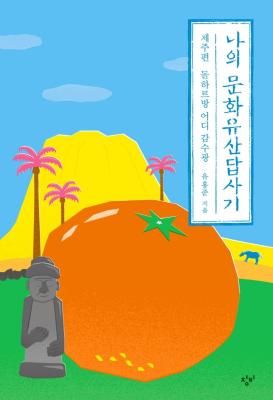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는 것은 자연이 내린 축복입니다.
우리 영토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고 제주도가 없다면 그 허전함과 서운함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그 뜻과 편리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가로세로로 구획지은 밭담들이 지형에 따라 구불구불 겹겹이 연이어 뻗어가며 철 따라 감자며 양파며 마늘이
싱그러운 초록을 발하고 있다. 밭담의 검은빛과 채소의 초록빛이 묘하게 어울리는 모습은 육지에선 볼 수 없는 보색이 된다.
-“본향당이란 제주사람들, 특히 제주 여인네들 영혼의 동사무소, 요즘 말로 하면 주민센터에요.
제주 여인네들은 자기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본향당에 와서 신고한답니다.”
-세련되기는커녕 조형이라는 개념도 없이 민초들이 자신들의 정서에 맞는 돌을 주워다 세워놓았을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친숙감을 느끼니 이것이 민속의 힘이고 아름다움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문화는 소비자가 만듭니다.”
-아픔의 유적지는 아픔의 유적지다워야 하는데, 이른바 폴(Pole), ‘그놈의 뽈대’를 세워놓은 충혼탑처럼 되어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이야기들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행여 무슨 오해라도 살까봐 4·3을 쉬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4·3사건을 당당히 얘기해야 한다. 그것은 외면한다고 잊혀질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조천에 왔으면 마땅히 너븐숭이를 들러야 진정함 답사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형식 자체도 여느 풍경화가들의 그것과 달랐다.
요배의 검은색은 제주 땅의 기본을 이루는 화산이었다.
그것은 제주의 ‘풍광’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이었다.
역시 그는 리얼리스트였다. 제주는 내게 새롭게 다가왔고 나는 그의 그림을 통해 제주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제주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름을 보고 자랐고, 거기에 의지해 삶을 꾸렸고,
오름 자락 한쪽에 산탑을 쌓고 떠나간 이의 뼈를 묻었다. 오름이 없는 제주도를 제주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순상화산이고, 오름이 있고, 용암동굴이 있다는 것이 제주도와 한라산 지질의 개요이며 특질이다. 얼마나 간명한가.
-김녕사굴과 만장굴은 주변의 벵뒤굴, 절굴, 발굴, 개우샛굴 등과 모두 하나의 동굴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동굴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15,798미터로서, 세계에서 가장 긴 화산동굴계로 인정받고 있다.
그 모체는 바로 거문오름이고 오른 정상 가까이에는 선흘수직동굴이라 불리는 낭떠러지 같은 동굴이 있다.
여기가 모태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수산에 등재 신청하게 된 것이다.
-“해녀는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의 정신이고, 제주의 표상입니다.”
-물 위로 솟을 때마다 ‘호오이’하면서 한꺼번에 막혔던 숨을 몰아쉽니다.
그 소리를 ‘숨비소리’라고 하죠. 숨비소리는 음정이 날카로우면서도 짙은 애상을 간직한 정 깊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대상군은 파도소리만 들어도 날씨 변화를 압니다. 바다라는 텍스트를 20년 넘게 읽어서 체득한 것이죠.
-생각건대 이 종달리 돈지할망당이야말로 가장 제주의 해신당다운 곳이다.
신령스럽게 생긴 바위와 작은 굴, 그리고 모진 바람에 가지가 굽고 굽으면서도 윤기나는 푸른 잎을 잃지 않은 생게남을 영험하게 생각하여 여기를 신당으로 삼은 것이다.
거기에 인간의 기도하는 마음이 서려 있는 오색천과 소지, 그리고 자연의 산물을 대표한 과일 몇알로 신과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제주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누가 이를 미신이라고 할 것이며 추하다고 할 것이며 가난하다고 비웃을 것인가.
-그러면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제주도의 한 곳을 떼어가라면
어디를 가질 것인가? 그것은 무조건 영실(靈室)이다.
-늦봄, 진달래꽃 진분홍 바다의 넘실거림에 묻혀 앉으면 그만 미쳐 버리고 싶어진다.
-삼성혈 유적지는 그 이상 볼거리가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삼성혈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제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제주도의 아이덴티티와 오리지널리티를 말해주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