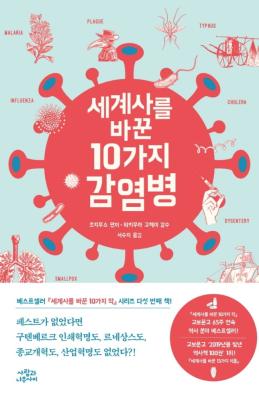코로나 19시대에 읽기에 대단히 흥미로운 책이었다. 책을 읽으며, 지금의 시대 이후에는 어떤 문화인류학적인 발전이 있을지를 곰곰히 생각해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사회문화와 시대의 변화를 무덤덤히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나의 예측과 비교해가며 세상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속에서 말로만 들었던 페스트가 어떻게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켜 온것인지 놀라운 연관성과 해석에 감탄을 하며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몽고의 세계 지배는 결국 전염병이 전 지구적 재앙으로 갈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면서 대규모 무역이 가능한 루트를 정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만들었으나, 이로 인해서 전염병도 너무나 퍼지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불과 2년전인가, 중국의 우한에서 이상한 병이 생겼다라는 뉴스를 보고 지금은 전지구가 위기를 겪고있다. 이와도 너무 비슷하다. 페스트로 야기된 인구의 감소와 노동의 부족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으며, 많은 죽음을 목도한 이들은 더 이상 신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이라는 지식에 목마르게 되었고, 책이라는 지식의 수단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의 발전으로 귀결되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과학을 접하면서 신에게 벗어나는, 인간의 중심이라는 사고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르네상스의 혁명을 꽃피우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서도 기술했지만, 울창한 숲에 산불이 나면 모든 것을 태우게 되나, 이후 다시 그 숲은 울창하고 아름답게 변화하는 자연과도 일맥상통하는 인류의 삶인것이다. 흑사병이라는 질병으로 전 인류가 소실되는 듯 했으나, 이후 인류는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창조하며 지금짜기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의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떤 문화적 진보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퇴보가 있을 것인지. 미래가 궁금하게 되는 대목이었다.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것이나, 당장 피부로 느끼는 변화도 상당히 큰것은 느끼고 있다. 작게는 회사의 회식문화가 엄청나게 바뀌었고, 종교적으로는 한국교회의 폐쇄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문화계에도 그 타격은 크다고 할수 있겠다. 대규모 공연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신간 영화도 극장에 걸리기보다는 개인들이 집에서 접할 수 있는 넷플릭스 등의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고 호평받는 시대가 되었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대체된 상태이고, 배달이 어느덧 모든 소비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환호하던 이전의 공연과 경기장 등은 되려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이 되었다. 질병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급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전에는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 집단면역이라는 이야기도 가끔 나온다. 집단면역이란 것이 과연 이렇게 변이가 많은 코로나19에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인간이 벌인 침략전쟁 등은 주요 질병의 루트가 되고 폭증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된 과거와 달리 이번 코로나19는 단순 교통의 발전, 지구촌이라는 환경변화가 범 지구적인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콜레라 역시 그 기원과 진행과정을 보니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었다. 영국의 침략전쟁으로 인핸 무역의 활성화가 가져온 판데믹이었다. 콜레라는 환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식수원 등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판데믹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나갔다. 당시의 하수시설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으며, 이로 인한 전염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과밀한 도시 인구밀도와 원시적인 배설물 처리 시설 등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콜레라가 창궐하기 최적의 조건이었으리라. 인도의 갠지스 강을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저기에 시체도 보내고 목욕도 하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판데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인류가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도, 그 병이 퍼질수 있는 루트도 모두 인류가 만든 인류의 재앙. 콜레라를 종식시킨 과학자 스노처럼, 지금 21세기의 스노가 나와서 지금의 코로나19도 종식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