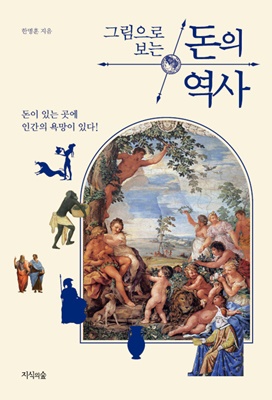돈의 역사에 대한 책은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시중에 떠도는 책만 해도 수십가지는 될거다. 그만큼 인간의 역사에서 돈은 빠뜨릴수 없는 주제인 것이다. 인간이 조개껍데기를 가지고 물물교환을 하면서부터 돈은 인간의 일상을 함께 해왔다. 은화에서 가장화폐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류는 다양한 돈의 형태를 경험해왔고, 어떤 형태였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돈을 대했다. 돈에 대한 사랑, 또는 열정, 아니면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욕망에서 출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새로운 부의 출연에는 언제나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어있고, 그 부를 차지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광기가 분출되었으며, 그 광기는 바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책이다. 돈을 향한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탄생과 멸망, 수난과 전쟁, 파멸과 창조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책이 그렇지만 '그림'이 들어간 책은 항상 흥미롭다. 이 책은 시대상이 반영된 명화를 통해 세계사를 더욱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렘브란트, 고흐, 뵈클린, 들라쿠루아 등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과 시대상을 담은 작품을 함께 보면서 예술과 역사의 긴밀한 관계도 읽어낼 수 있다. 코로나19 시국에 외출이 조심스러운 요즈음이다. 방구석 전시회를 연 듯 이 책을 펼쳐보면서 마치 인사동 어느 작은 갤러리에 선 느낌이 든다.
달러의 기원을 보자. 쿠트라 호라라는 유럽의 도시가 등장한다. 한 때는 유럽 최대의 은광 도시였다고 한다. 1300년대에는 조폐국을 세워 프라하 그로센이라는 은화를 발행하였고 1516년에는 요아힘스탈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었다. 더 많은 은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게 요아힘스탈에서 은광이라는 잭팟이 터지면서 쿠트나 호라는 엄청난 부자 도시가 되었다. 사람들은 부를 안겨준 광산을 신의 축복으로 여겼고, 교황은 요아힘스탈에 축복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은화는 요아힘 골짜기에서 나온 돈이라는 뜻으로 요하임 스탈러, 요하임 스탈러 그로센이라고 불렀고 이는 탈러로 줄여서 부르게 된다. 이 탈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러의 기원이라고 한다.
우리가 고대라고 분류하는 시대부터 이 시점까지,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짧고도 사소하다. 그런 인류사에서 돈의 출연은 또 얼마나 짧을까.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인간과 돈이 만들어낸 사건은 얼마나 하찮은가. 그 하찮은 사건 동안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돈을 좇아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의 유대인 탄압이다. 흑사병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시대, 유대인에게 빚을 졌던 봉건 영주들은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유대인을 잡아들인다. 일반 서민들도 봉건 영주들의 편에 섰다. 그들 역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에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이권 다툼을 하던 길드들도 대중을 선동한다. 이에 유대인은 살아남기 위해 빚을 탕감해주는 서약을 했다.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의 재산은 봉건 영주와 교회로 귀속되었음은 물론다. 결국 이 참혹한 유대인 학살은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비극이라 할 수 있다.
흑사병에 따른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부의 대이동이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발발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이 때문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17세로 내려갈 정도였다. 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자가 탄생한다.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다중 상속을 받아 졸부가 된 사람이 많았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져 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해 노동자와 농민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도 했다 한다.
이렇게 여러 사람 잡고도 남았던 흑사병은 도대체 왜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인들을 괴롭혔을까? 흑사병이 유럽으로 퍼지게 된 건 몽골 제국 때문이었다고 한다. 13세기 초 지구에 소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중앙아시아 목초 지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풍요롭던 땅이 메말라가면서 몽골의 칭기즈칸은 유럽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 흑사병 시신을 가지고 말이다. 페오도시야라는 도시를 정면으로 치는 것보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몽골 제목은 손 안 대고 코를 풀었다.
오즈의 마법사를 빚댄 챕터도 재밌었다. 캔자스 주에 사는 도로시가 회오리바람에 오즈로 날아갔던 동화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생한 금본위제와 은본위제를 둘러싼 정치 투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고 한다. 도로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농촌도시인 캔자스에 사는 전형적인 미국인을, 오즈는 금의 단위 온스의 약자이고, 도로시가 여행한 노란 벽돌길은 금본위제를, 도로시의 소원을 들어준 은 구두는 은본위제를 의미했다고 한다. 동화 하나에 이런 의미가 숨어있었다니. 이 책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