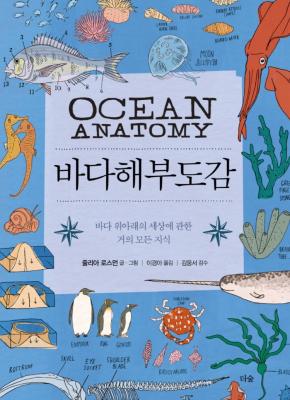이 책은 바다와 바다 동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나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 첫번째로,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햇빛이 바닷물에 반짝일 때 물 분자는 스펙트럼의 붉은 부분에 있는 빛을 가장 먼저 흡수한다. 따라서, 빨강, 주황, 노랑의 파장색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 분자는 필터처럼 작용하여 스펙트럼의 푸른 부분에 있는 색만을 남겨두는 것이다.
두번째로,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 바다의 소금기는 육지에서 온 것으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빗물이 암석을 깎아내리면서 암석에 들어 있던 광물질을 녹였고, 이것이 강물에 실려 와서 바다에 쌓인 것이다. 소듐 이온과 염소 이온은 바닷물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짠맛을 내는 물질이다.
세번째는 물에서의 소리의 속도이다. 소리는 공기를 통과할 때보다 4배 빠른 속도로 물을 통과한다. 이는 물이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인데, 소리는 빽빽한 물 분자 사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섭씨 21도에 가까운 바닷물은 제트기보다 훨씬 빠른 초당 1.6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소리를 전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고래 종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번째는 바닷물의 움직임인 해류이다. 조석 현상은 해류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라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 때 조류는 해변 가까운 곳에서만 강하다.
온도와 염분 차이에 따른 바닷물의 흐름인 열염순환은 깊은 해류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다. 극지방 부근의 바닷물에서 얼음이 형성되면 주변의 차가운 바닷물은 염분과 밀도가 좀 더 높아진다. 염분과 밀도가 높은 차가운 바닷물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표층수는 제자리를 찾아 흐르게 된다. 이처럼 밀도에 의해 생긴 바닷물 순환은 바다에서 깊은 해류를 형성한다.
해류는 육지의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이는 페루와 노르웨이의 기후 차이에서 알 수 있다. 페루는 적도에서 남쪽으로 불과 12도 위치에 있지만 차가운 훔볼트 해류 때문에 서늘한 기후를 보인다. 반면, 노르웨이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동일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따뜻한 기후를 유지한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상어에 대한 오해이다. 상어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위험도로 치면 번개나 잔디 깎는 기계에 크게 밀리는 수준이다. 500 종이 넘는 상어 가운데 인간을 위협하는 것은 10여 종이 채 되지 않는다. 매년 상어가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90건을 넘지 않으며 더구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공격을 한 경우는 몇 건 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해마다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북태평양 해류는 환류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용돌이를 형성하는데, 그 결과 바다 위를 떠다니던 플라스틱이 집중적으로 모인다. 전세계 바다에는 5개의 거대한 플라스틱 오염 지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쓰레기섬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면적의 16배 크기이다. 쓰레기섬에는 2조 개에 가까운 플라스틱 조각이 모여 있고, 이들 플라스틱의 무게만 해도 대략 9만 톤에 이른다. 이는 전세계 인구 1인당 285개의 플라스틱을 배출한 셈이다.
쓰레기섬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고형의 섬이 아니라 바다 상층부에 있는 플라스틱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영역을 의미한다. 플라스틱 일부는 해수면 아래로 떠다니고 일부는 아주 작은 미세플라스틱 조각이기 때문에 쓰레기섬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자외선, 염분, 파도에 의해 플라스틱은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된다. 이 플라스틱의 80% 이상에는 적어도 한 가지의 독소가 들어 있고, 이는 해양 동물의 몸 속에 그대로 쌓인다. 한마디로 우리가 먹는 물고기의 3분의 1은 뱃 속에 플라스틱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1도 가량 상승했고, 그 대부분은 지난 35년 동안 올랐다. 해수면은 약 20센치미터 가량 상승했고, 80년 후에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 바닷물이 증가하고, 해수면은 30-122센치미터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30년 후, 여름철 북극에서는 얼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미래를 막기 위해서 국가간, 개인별 적극적인 환경 수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