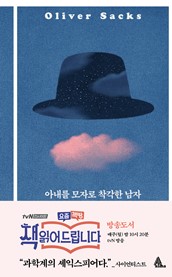그 누구의 동정과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것. 이것또한 가혹한 시련이다.
그녀는 장애인이지만 그것이 겉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는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신체가 마비되지도 않았다.
겉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종종 거짓말쟁이나 얼간이로 취급된다.
우리사회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취급을 받는다.
겸손이란 용어는 신경학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신경 기능의 장애나 불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 말은 말소리 상실,ㅇ ㅓㄴ어상실, 기억상실, 시각상실, 정체성상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능의 상실 그리고 그밖의 많은 특정기능(또는 능력)의 결함이나
상실을 지칭할때 쓰인다. 이러한 '기능장애'들(이것역시 자주사용되는 단어이다)에는 그것들 각각을 지칭하는 (우리들만의)
전문용어들이 잇다. 소리못냄증,. 운동성 실어증,언어상실증, 읽어언어상실증, 행위상실증, 인식불능증, 기억상실, 조화운동불능증 같은 것이 바로 그런용어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질병이나 부상 혹은 발달 장애로 인해 환자들이 특정 신경 혹은 정신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뇌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1861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브로카가 뇌 좌반구의 특정한 장애 즉 언어상실증이 반드시 뒤ㄸ까른다는것을 밝혀낸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대뇌신경학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 후 수십년에 걸쳐 사람뇌의 '지도
가 그려짐에 따라 언어, 지각등의 능력은 각각 그에 해당하는 뇌의 특정 '중추'들이 관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세기
끝 무렵이 되자, 좀더 예리한 관찰자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특히 ㄹ프로이트는 자신의 책 <언어상실증> 에서 기존의 뇌 지도가 지나치게
단순하며, 모든 정신활동에는 매우 복잡한 내적 구조가 있고 그와 똑같이 매우 복잡한 생리학적 원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인지나 지각능력에 발생하는 특정한 장애를 연구하면 그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인식 불능증'이란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는 언어상실증이나 인식불능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더 새롭고 세련된 과학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프로이트가 염두에 두었던 새로운 과학은 제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러시아에서 모습을 드래냈다.
'열등한' 반구라고 불리는 멸시를 당할 정도로 우반구에 대한 연구소가 소흘하게 다루어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좌반구의 손상 부위와 그에 따른 증상을 밝혀내는 것이 비교적 쉬운일이었던 데 반해, 우반구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증후군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우반구는 좌반구보다 좀더 '원시적'인것으로 비하되곤 했다. 반면 좌반구는 인간의 진화가 만들어낸 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주장이 옳다. 좀더 정교하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영장류의 뇌, 특히 인간의 뇌에서는 가장 나중에 발달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중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능력을 담당하는 것은 우반구이다.
이 우반구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그 컴퓨터에 해당하는것이 좌반구 이기때문에 이쪽은 말하자면 프로그램과 도식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고전적인 신경정신학은 사실보다 도식쪽에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우반구에 원인을 가지 ㄴ증후군이 나타나면 그것을 특이하고 기묘한 현상으로 간주했다.
과거에도 우반구의 증후군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반구를 연구하려는 시도는 어쩐 일인지 번번이 무시되고 말았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루리야는 말년에 지은 저서 중의 하나인 <기능하는 뇌>에 서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운반구의 중후군에 대한 고찰을 덧부텼다. 지극히 짧으면서도 대단히 흥미를 끄는 날카로운 고찰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혼지었다.
지금까지 전혀 연구된 적이 없었던 이런한 결함은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운데 하나로 우리를 인도한다. 즉 직관적 지각작용에서 우반구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대단히 중요한 이 분야의 연구는 지금까지 소흘히 취급되어 왔다. 나는 앞으로 작성할 논문에서 그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