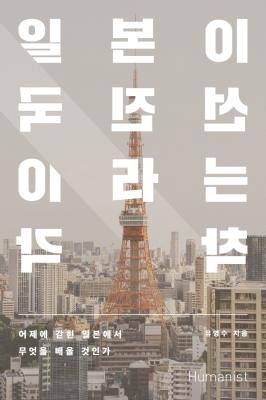가끔 선진국 일본이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들때가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 책은 단순히 일본이 이제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책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 일본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는 점이 맞는 거 같다. 물론, 어떤면은 선진국이라는 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이 세계3대 경제대국으로서 그 규모나 영향력, 시스템 등을 후진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우리가 더 심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다. 남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야말로 일제강점기와 해방후 1990년대 초까지 자의반 타의반 일본의 시스템을 이식, 모방, 학습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압축 근대화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한다. 속도를 우선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순위에 두는 것, 소통보다 권위주의적인 일처리를 중시하는 것, 낡고 일그러진 전근대적인 관행을 전통으로 감싸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후유증에서 일본의 후유증을 보기도 하고, 그들 문제에서 우리 문제의 뿌리를 보기도 한다." 저자는 몇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일본이 여타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일본의 사법시스템이다. 일본은 개인의 개성은 잘 보호하면서도 인권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법시스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법체계 자체가 근대화 초기 국가권력을 최고로 여기던 시절의 시스템에서 크게 변화발전되지 못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일본에서는 검찰에 한번 기소되면 무죄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어떤식으로든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99.9%. 이 숫자는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받는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다시 말해 한번 기소되면, 대부분이 거의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재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다. 웬만하면 구속되고 자백하지 않으면 장기간 구금되는데, 기소되면 거의 유죄라니, 기소되면 말 그대로 끝장인 셈이다. 상당수 일본 변호사와 법학자가 99.9라는 수치를 일본 사법체계를 비판할 때 쓰는 이유다. 또다른 카테고리는 일본에서의 여성의 지위다.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는 법적으로도 차별받는 것이 있을 정도다. 이는 메이지시대의 민법이 아직도 현재 법체계에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가부장적인 문화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정도를 뛰어넘기도 한다. 이는 일본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문화적인 면을 보면, 한 때, 일본은 아시아 문화를 대표해서 전세계를 매혹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일본 내에서만 안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또다른 단면이다. 이런 면에서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해체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이 가졌던 선진국에 대한 환상에도 금이 가고 있다. 그들이 선진국이란 명성에 걸맞지 않게 코로나 19에 우와좌왕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던 선진국가들이 줄줄이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일본은 실망을 넘어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가 회의를 품었다. 사실 선진국론 자체가 강박에 가까운 허상인만큼 당연한 결과다. 선진국론은 서구 우월주의 시각에서 국가의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가깝다. 세계의 여러나라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고 끊임없이 줄을 세우려는 불온한 의도가 숨어 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인 앞서나가는 의미로서 선진국이라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나 과거에 앞서갔다는 사실이 문제를 앞서 해결했음을 뜻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일본의 단점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는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든 그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은 근대화의 매개체였다. 우리는 일본이 번역한 서구를 다시 번역했다.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일본의 시스템을 학습하고 모방했다. 그리고 일본을 따라간 덕분에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지만,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질곡이 되고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어쩌면 계속됐던 행운이 지금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도 지정학적 위치와 냉전 그리고 미국의 일본 우선 정책 덕분에 제도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을 이룰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 행운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고칠 기회를 흐지부지 놓쳐버렸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가를 나눠서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를 이해하려면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일본은 우리를 구성하는 커다란 조각 중 하나다. 기분 나쁘다고 무시하면 우리는 영영 '정체성의 퍼즐'을 제대로 맞출 수 없다. 여전히 우리 곳곳에 묻힌 유골과도 같은 진실을 캐어 드러내고 깨끗하게 털어내야 한다. 일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