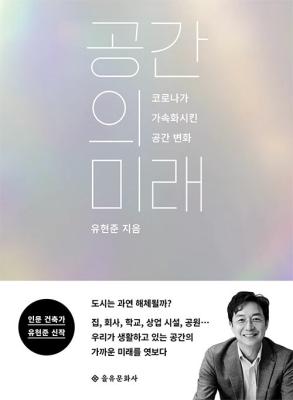건축가이자 교수인 저자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변화 방향성을 제시한다.
건축은 사람이 만드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작품이다. 하나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돈 뿐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사 결정이 협업을 이루어야 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허가 또한 필요하기에 한 사회의 건축물은 그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 하교, 직장, 종교시설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좋았다. 몇 가지 흥미로웠던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겠다.
- 공간의 해체와 재구성, 권력의 해체와 재구성
우리가 보는 많은 권력은 공간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시선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의자는 모두 칠판을 향해 놓여 있다. 이 때는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권력을 갖게 된다. 줄을 맞춰서 앉아있는 아이들은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적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옴싹달싹 못하는 제약을 받게된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쉽게 벗어 버릴 수 없다. 이 시공간적 제약이 곧 사회 시스템이다. 공간이 만드는 사회 시스템에 주는 제약은 보이지 않게 사람을 조종한다. 동영상 강의는 아무 때나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된다. 사람에게 시공간적으로 자유를 많이 줄수록 관리자의 권력은 줄어든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바뀌는 수업의 형태는 기존의 학교 건축 공간이 만들었던 권력의 구조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 동영상 수업이 보편화 되고, 기존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만들어진 권이가 사라지면 교사들이 불필요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선생님의 역할이 새롭게 만들어 질 것이다. 지식 전달의 기능은 일타강사나 유튜브상 각종 동영상 자료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은 지식 전달이 전부가 아니다. 선생님은 지식 전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해답은 대화에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선생님에서 학생으로 일방적으로 전수되는 흐름이 아닌, 학생과 대화를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 내면의 것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큰 역할이 될것이다.
- 대형 조직의 관리와 기업철학
향후 점점 더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일을 하다 보면 한 프로젝트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의사결정을 해서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쉽다. 그렇다면 어떻게 각기 떨어져 있는 팀원들의 뇌를 고조시켜서 재즈 연주 같은 민첩하면서도 완성도 있는 화음을 만들 수 있을까? 팀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잡아줄 철학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회사는 누가 보아도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는 기업이라는 철학이 느껴진다.
- 정부와 대자본가만 지주가 되는 세상
매년 경제 성장을 목표로 움직여서 인플레이션 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선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계속 뒤쳐지게 된다. 반대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면 경제 성장의 열매를 나눠 가질 수 있다. 우리 부모세대의 경우가 그랬다. 베이비붐 세대가 돈을 번 이유는 1970년대에 ㅈ비을 구매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매년 10퍼센트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되자 덩달아 집값이 올라가서 큰 자산이 된 것이다. 이 때 대출을 끼고 더 비싼 집을 산 살마은 더 큰 이익을 봤다. 이것을 투기고 나쁜 행도잉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중에 돈이 있어도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이 있나 확인해 보기 바란다. 나는 수십채의 집을 소유해서 집값을 올리는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한 채의 집을 소유할 것이냐 임대로 살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상을 현상 그대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현상을 이해하기 전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자세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