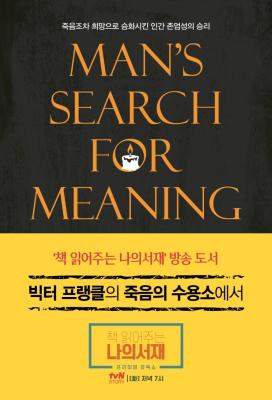1. 이 이야기는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저술되었다.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홀로코스트라 불리우는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였는데, 저자는 그러한 강제수용소에서도 온전히 살아남았다. 물리적으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전쟁을 이겨냈다. 저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이나 가스 등에 의해 죽기보다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위협속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기운이 빠져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저자는 본인이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을 ‘로고테라피’에서 찾는다.
2. 로고테라피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존재의 본질을 꺠닫기 위해 끊임없이 본인의 삶을 뒤돌아보고 목적을 설정하게 한다. 특히나 와닿았던 문구는 이 말이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참으로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1) 현재가 지나간 과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2) 지나간 과거가 아직도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은 인간으로 하려금 삶의 ‘유한성’은 물론, 그가 자신과 자신의 삶으로부터 성취해 낸 성과의 ‘궁극성’과도 대면하게 만든다. 또한 로고테라피는 자신을 반추하게 만든다. 로고테라피는 대상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도록 하고자 노력한다. 무엇을 위해, 무엇에 대해, 혹은 누구에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맡긴다. 그리고 또한 로고테라피는 마치 안과 의사가 하는 일에 가깝다. 무엇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3. 로고테라피에 따르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세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1)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서, 2)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서, 3)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중 특히 와닿는 것은 3)번이다. 저자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라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먼저 저자가 정의하는 시련은 ‘그것이 시련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현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어떠한 일이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시련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련’을 알게됨으로서 ‘그 순간 시련이 멈춘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련을 마주하고 그것이 시련이라는 것을 알게된 순간,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취해야할 의미있는 행동이기 떄문이다. 불필요하게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저자의 경험이 더욱 로고테라피를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강제 수용소에 처음 도착한 뒤, 저자는 작성중이던 원고를 빼앗긴다. 정신적 자식을 잃는 고통 속에서, 다른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있어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내 삶이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저자는 ‘임종의 순간’을 떠올린다. 마치 여든살의 노인이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할때, 지금의 고통이 자신의 삶에서 큰 의미가 없음을 꺠닫는 것이다. 삶은 단 한번만 살 수 있다. 한번만 살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5. 아주 오랜 기간 정신 의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았고, 그 결과 정신 질환 치료를 하나의 테크닉으로만 간주해왔다. 하지만 인간은 여러개의 사물 속에 섞여있는 또 다른 사물이 아니다, 사물은 각자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에 있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시 자신을 규정한다.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라는 제한된 조건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달려있다.
6. 오늘부터라도 늦었지만 삶의 의미를 고민해보아야겠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고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며 내 삶을 채워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