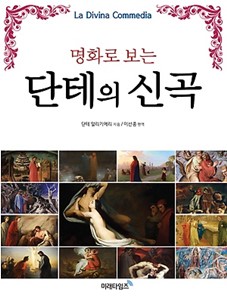역사를 알려 하다가 보면 일리아드, 오딧세이 그리고 그리스, 로마, 북유럽의 신화를 들춰 보게 되는 것처럼 르네상스를 좀 더 깊이 알려다 보니 덜컥 집어들게 된 단테의 신곡. 한번쯤은 들어봤을 단테의 신곡은 다빈치코드 시리즈에서도 나올 만큼 꽤 많은 사람이 들어는 봤어도 읽어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지구 위를 걸었던 최고의 지성이 쓴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을 너무 늦게 접한 건 아닐까 하는 부끄러움은 필요 없다. 그의 대작이 세상에 드러난 지 수 백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나 인류의 역사에서는 찰나의 시간일 뿐이고 아직도 호모사피엔스의 르네상스는 진행중인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말이다.
신곡의 원제목은 Commedia 즉 ‘희곡’ 또는 ‘희극’이다.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옥 편>에 비해 <연옥 편>과 <천국 편>은 매우 쾌적하고 행복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슬픈 시작’에서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하여 이 같은 제목이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보카치오가 다시 이 제목에 형용사 Divina를 덧붙임으로써 단순한 희곡 차원을 넘어 숭고하고 성스러운 뜻을 가진 Divina Commedia(신성한 희곡)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표면상으로 볼 때 『신곡』은 ‘사후세계를 중심으로 한 단테의 여행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홉 살의 나이에 만나 연정을 품었던 베아트리체를 향한 순수한 사랑, 현실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겪어야 했던 고뇌에 찬 오랜 유랑생활, 그리고 또 망명 이후 심각한 정치적, 종교적 문제들로 인해 계속 고민해야 했던 단테가 자신의 양심과 고민 속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까지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다.
『신곡』에서 아홉 개의 구역으로 분류된 지옥은 영원한 슬픔과 괴로움의 세계를 나타내고, 일곱 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연옥은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곳이다. 그리고 열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 천국은 인간들이 하느님에게로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결말은 기쁨으로 끝이 난다.
단테의 『신곡』은 윤리의 필요성, 선과 악의 개념, 신앙, 사랑, 인간 공동체의 연대, 영원한 생명의 기쁨, 독창성 등이 완벽하여 이탈리아어의 기초로까지 이어진 작품이다. 이 책이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가치관의 혼란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겪으며 인간의 가치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어느 것이 참다운 길인가를 제시해 주는 사랑의 메시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책은 단테의 여정을 상황에 맞는 명화와 같이 보게하여 상상력이 부족한 독자라도 이해하기도 쉬운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작은 시처럼 쓰여있다고 하나 그걸 문어체로 쉽게 풀어쓴 것도 좋았다. 그러나 이탈리어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만큼 단테의 신곡은 새계 문학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독자가 그것을 몸소 느끼려면 원작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의 천국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설계로 지어진 것이지 하느님의 것은 아닐 거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시의 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실체를 그것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그는 사기꾼 또는 이단일까?
현대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에서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은 듯한 태양계 항성과 행성들의 궤도에 놓인 아홉 단계 천국과 그 너머에 있는 궁극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젠 태양계를 떠나 궁극의 영역으로 멀어진 보이저호가 그곳들을 훑고 지나며 알려줬기 때문이랄까?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천국을 믿으며 그곳에 가길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체의 성물을 거부하는 개신교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깨닫기에는 너무나 지고한 하느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상징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해 온 카톨릭이 현세에 공존하고 있다. 옳고 그름은 하느님의 것일 뿐이고 결국 그 둘이 그리는 천국이란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천국, 하느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 하느님 계신 곳이다. 그러면 우주가 천국이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고 연옥은 어딘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상징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단테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상징화 하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무언가 안다는 것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현대 수학에 쓰이는 다양한 기호들은 대부분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그리고 몇 년 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잠들어 있는 뉴턴의 곁에 묻힌 스티븐호킹에 이르기까지 매우 영민한 여러 과학자들이 만들어 낸 것은 라이프니츠가 만든 상징들의 조합과 묶음, 즉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들이었던 거다.
단테가 이미 천국에서 거리의 개념이 다름을 얘기하며 운을 띄웠던 걸 수 백년 뒤 아인슈타인이 받아 상대성이론의 우주의 시공간으로 대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테가 무한에 이름을 자조했던 원의 둘레를 재는 것에 후세는 파이라는 기호를 만들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테가 꿈과 서술로 표현했던 우주는 그대로이며 다른 건 지금 우리는 과학적 탐구와 수학적 서술로 표기하려 할 뿐이란 거다.
프톨레마이오스와 단테의 우주, 천국이 지금 우리의 그것과 달라 보이지만 그 스스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의 이해와 표현이 바뀌고 있었을 뿐이고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초끈이론 등에까지 변모해 온 현재의 이해 역시 어느 미래에는 바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는 있는 그대로일 것이니 천국과 지옥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하느님 만드신 모든 세계가 다 있는 거다. 고전의 부활, 근본적인 탐구, 르네상스는 계속된다. 당시의 시대적 사고의 한계였겠지만, 성평등을 알지 못했던 단테를 이끈 영혼이 베아트리체였다는 건 미묘한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