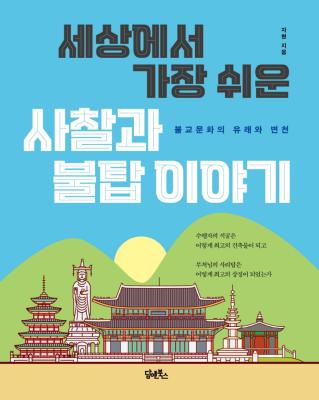자현스님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찰과 불탑이야기. 오늘날 우리 문화유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찰과 불탑. 우리의 오랜 역사와 함께 이 땅에서 숨쉬어온 것들이다. 너무나 익숙하기에 무관심하지만 여기에는 오랜 시간과 수 많은 인물들에 의한 인류 문명의 대교류의 과정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 우리와 전혀 다르리라고 여겨지는 문화의 잔재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땅의 사찰과 탑속에 숨어 있는 데, 자현스님은 이를 이야기 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고로는 승려들은 당연히 사찰에 거주하였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불교가 시작된 초기에는 사찰 또는 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교가 발생한 인도의 기후특성과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종교적 교리 등으로 인하여 거주개념의 공간(소위 집)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불교는 집착의 여윔이라는 측면과 수행 생활의 효율성이라는 두가지 중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행에서 집단생활이 강조되는 것은 서로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고 안정된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행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사실 승려라는 말도 집단을 의미하는 승가의 축약인 숭과 복수를 의미하는 여가 결합된 말이다. 그래서 사찰 또는 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주공간 즉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수행공간으로서 석굴을 선호했다. 여기에는 석굴이 시원하고 새벽이슬을 피할 수 있고 또한 명상을 방해하는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석굴은 불교가 전파되는 경로를 따라 계속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석굴인 석굴암에까지 이르게 된다.
탑이란 인도말 스투파를 음역한 탑파가 탑으로 축약된 것이다. 원래의 의미는 상투와 정수리 같은 최상의 의미를 가지는 데 이는 군주의 무덤으로 흙을 높게 쌓아올린 봉분형태(토루)가 탑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화장 문화와 결합하여 일반화되는 것이 바로 탑이다. 즉 화장 때 발생하는 뼈를 넣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려 추모의 기념물을 만든 것이 탑이다. 이로 인하여 탑의 뜻도 무덤과 사당의 의미로 전환된다. 이후 탑은 인도의 우기를 견디는 과정에서 재료가 벽돌이나 돌로 변화하기에 이른다. 부처의 제자 중 나이많은 제자들이 부처보다 먼저 죽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때 장례에 대한 것이 논의 되고 여기에서 불교식 탑의 원초적 기원이 이루어 진다. 돌이나 벽돌을 이용하여 4각형이나 8각형 또는 원형으로 만들고, 탑의 위쪽에 일산을 배치하고 4방향에는 당, 번과 같은 장엄한 깃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일산은 인도가 무덥기 때문에 망자에게도 양산을 씌워 주는 문화에 의한 것으로 존귀함을 상징한다. 또 장엄 깃발은 이곳이 신성한 곳임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일산은 존귀한 분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3층으로 된 것이 일반화되며, 후대에는 13개까지 증대된다. 인도 문화권에서는 탑뿐만아니라 불상에도 일산이 씌워진다. 부처가 제시한 탑의 형태는 이후 4각형 기단에 반원형의 봉분과 같은 형태가 올라가고 그 위에 일산이 놓이는 방식으로 정형화된다. 또 여기에 탑을 보호하고 예경 수단으로서 탑돌이가 가능한 난각과 탑돌이 길인 요도가 만들어지며, 4방향에 맞춰 문이 갖춰지는 형태로 완성된다.
불교에서는 사리가 들어있는 탑을 스투파라고하고 기념탑을 차이티야하고 한다. 차이티야는 지제라고 번역되는 데, 사리나 뼈(영골)를 봉안하지 않은 성소나 기념물을 의미한다. 석굴사원에서 중앙의 예배공간에 탑을 모신 형태 역시 차이티야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탄생지를 기념하는 것과 같은 기념탑도 다수 존재하는 데, 이런 탑이 바로 차이티야(지제)이다. 대표적인 곳이 부다가야의 바즈라사나사원(현재의 마하보디대탑사)이다.
후대에 불교가 발전하게 되면서 부처의 사리가 제한적이지만 탑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 사리탑을 대신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차이티야이다. 그러나 사리를 봉안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진리의 정수 즉 법신사리라고 해서 붓다의 가르침인 경전을 모시는 탑을 만들기도 하였다. 탑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 동아시아에서는 고승들의 모신 탑을 붓다의 탑(스투파, 탑)과 구분하여 부도라고 한다. 이 부도는 붓다의 음역으로 광의적으로 불교와 사찰 및 탑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인도불교에서는 탑을 사리탑과 기념탑으로 구분하여 각각 스투파와 차이티야로 구분했다. 이에 반해 불사리탑과 고승의 사리탑에 대한 명칭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전래의 사리탑과 동아시아 고승의 사리탑을 구분하였다. 현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도라는 명칭이 붓다에 대한 음역이므로 고승의 사리탑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부도를 고승의 사리탑이라는 의미에서 승탑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부도라는 표현이 더 일반화되어 있었다. 의미적으로는 승탑이 맞고 관습적으로는 부도가 올바르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