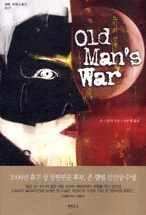Ⅰ. 들어가며 : 우주전쟁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곳인지를 설명한다. 그 거대한 공간을 상상해보면, 대게는 그 큰 공간에 고등 지적 생물체라곤 인간만이 있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게 된다. 많은 과학자와 소설가들은 우주에 우리 말고도 다른 지적 존재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SF는 그런 상상적 기초 위에 쓰여진 문학 작품이며, 현실을 미래로 이끈다. '노인의 전쟁' 또한 그런 상상의 산물이나, 그 상상이 '사실'임을 전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서사를 넓혀 나가고 있다.
Ⅱ. 우주 개척 방위군
1. 경험의 가치
(1)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밈(meme)'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밈이란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 요소를 의미한다. 우주 개척 방위군은 바로 이 밈을 이용하기 위해 노인을 모병한 듯하다. 수 십 년간 축적된 노인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 말이다. 예를 들면, 주인공의 친구 해리 윌슨은 고교에서 20년간 물리학을 가르치다가 입대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 외계의 물리학을 연구하고 응용하게 된다. 또 존 페리(주인공)는 지혜로 빚어진 임기응변을 통해 효율적인 전투를 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그냥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하고 말이다. 어느 시장이건 경력직을 선호하는데 이들 아버지 세대는 나이가 많을 뿐이지, 사실 그 '경력'이라는 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쌓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2) 윤리 등 사회문화적 요소 또한 경험으로 축적되며, 그것에 얼마나 능숙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존재의 '사회화'정도를 말하곤 한다. 노인들이란 세상의 윤리 등 규범을 가장 극단적인 시점까지 경험한 존재이며, 우주 개척 방위군은 노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전쟁에 활용한다. 그것이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와 싸우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들은 대부분 가족을 부양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목표를 넘어서 '인간애'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이 그 소프트웨어의 핵심이다.
2. 진짜와 진짜 아닌 것
제인은 사망 후 인간 병기로 업데이트된 존재로서 스스로 '진짜가 아닌 존재'로 생각한다. 생전의 기억 대부분을 잃었다는 점에서 진짜가 아닌 존재는 '진짜'인 페리 등과는 다르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대신 강력한 신체와 효율적인 두뇌를 얻었는데, 이 점에서 '진짜'를 능가한다. 둘 중 어느 존재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았다. 변변찮은 젊은 날의 생 때문에 진짜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며, 가족,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전자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3. 유대와 사랑
노인의 전쟁을 이끄는 큰 두 갈래 줄기 중 하나는 외계와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다. 페리가 우주 개척 방위군에 입대한 직후부터 사람들과의 유대가 생겨났고, 아내와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제인(아내)'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삶을 이끌게 된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지키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실된 사랑을 해본 사람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긴 시간을 산 사람일 것이고, 노인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깊게 해본 존재이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 개척 방위군은 방위군 군인들의 사랑 놀음을 방치한 것일지도 모른다. 삶에 대한 애착이야말로 삶을 이끄는 동력인데, 사랑은 삶에 대한 애착을 낳기 때문이다.
Ⅲ. 마치며
1. 책을 다 읽고 나면, 특히 그 책이 번역본일 경우에는 더욱 더 옮긴이의 '옮긴 책'을 살펴본다. 이것은 내가 탐독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식이며, 이 전략은 대게 성공적이었다. 늘 즐거움이 가득한 작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르귄의 '헤인 시리즈'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다.
2. 작가는 프롤로그를 통해 로버트 A. 하인라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다. 유머와 사랑이 담긴 SF는 하인라인의 전매특허이고, 작가는 그 컨셉을 이어받아 '노인의 전쟁'을 쓴 까닭이다. 덕분에 독서 후에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여운을 즐길 수 있었다. 언젠가 글을 쓴다면 이처럼 유머와 사랑을 담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