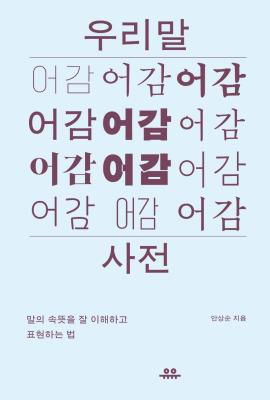[우리말 어감사전] 안상순 지음
책 한 권을 읽는다. 그 속에는 두 가지 세계가 놓여있는데, 하나는 ‘이야기’이며, 다른 하나는 이야기각 품고 있는 ‘문장과 단어’라고 여긴다. 나는 책을 읽을 때면 숲길을 거닐 듯 느껴질때가 있다. 나를 책이라는 숲으로 이끈 것은 ‘이야기’이지만, 숲속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건, 이야기가 품은 문장과 단어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이다. 어느 때는 문장 속 단어 하나나가 ‘이야기 전체를 품고 있는 씨앗;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 감정이 다가설 때면 ’연필 꽃이 단어사전;을 ㄲㅓ냐고 새로이 마주한 ‘;단어’를 따로 모아놓기도 한다. 오랜 습관이다.
출판사 ‘유유’에서 펴낸 안상순 작가의 [우리말 어감사전]을 읽는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가 오래도록 숲속에서 무물 수 있도록 한, 단어의 쓰임‘에 관해 마치 ’새로 만난 세계‘처럼 흥미로웠다. 늘 쓰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단어가 있다. 그 단어 앞에서 가만히 무릎을 괘고, 햇살 좋은 어느 날 아침부터 노을 물들 떄까지 [우리말 어감사전을] 을 덮지 못했다. 종흔 책을 읽고 나면, 마음 어딘가에 어릴 때 놀던 ’작고 반짝이던 구슬;‘을 잔뜩 모아 놓은 듯하다. 내일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구슬이 많다는 건, 그만큼 풍요로운 상상에 이르게 하는 재산이었은니까. 글쓰기도 마찬가지가 이닐까. 제대로 알고 쓰는 우리말은 ’글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이라 여긴다.
우리말 어감사전의 뒤표지는 같은 듯 다른 듯 동질성과 이질성을 제대로 한 번 톺아보고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사전을 만들면서도 미처 건드리지 못한 우리말 유의어의 시계를 들여다보고 싶었지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독자에게는 갖고 있던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전하고,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독자에게는 유의어라는 허들을 조금이나마 쉽게 넘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말 어감사전] 뒤표지 글 중
모든말은 소중한 우리말 자원이자 한 시대의 문화와 사유가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한 많은 어휘를 채집하고자 노력했고 방치된 말을 부지런히 찾아 풀이를 붙였다. 그럼에도 사전 펴찬은 끝나지 않는 미완성의 작업이라고 느낀다.
[우리말 어감사전] 책 날개 작가 소개글 중
안상순 작가의 우리말어감사전을 읽는 동안 ’식물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씨드볼트‘라는 곳은 ’씨앗을 저장하는 금고‘라ㅓ는 뜻을 지녔다. 전 세계 40만종의 식물을 모아 둔 씨디볼트의 목적은 “미래에 이 식물들이 필요하게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 사용한 것, 그러니까 미를 위한 곳”이라는 것인데 조금 결이 다르지만 우리말 어감사전을 읽으면서, 우리말이나 글의 씨앗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했다. 꼭 필요한 책, 책상 곁에 놓아두고 자주 펴는 책이라 여긴다.
[우리말 어감사전]을 쓴 작가는 금성출판사에서 사전팀장으로 오래 일했고, 그와 동료가 펴낸 책은 우리집 어딘가에 놓여 있는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인데, 그는 이후에도 ’국어사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을 했고, 최근 펴낸 [우리말 어감사전]도 그 노력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누구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능력속에는 비슷한 두 세단어를 구별해 쓰는 능력도 포함되지요, 가령 ‘간섭’괘 ‘참견’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두 설명하지 못해도 내정 뒤에는 갑섭이 와야하고 지나친 뒤에는 간섭과 참견 모두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으로 압니다. 강연과 강의는 얼핏 같거나 비슷한 말 같지만 가연장소는 자연스럽게 강연장 강의 장소는 강의실이라고 부리지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문맥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작가는 국어사전을 펴내는 일을 하는 동안, 사전 속에 담지 못한 단어들의 쓰임과 속뜻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까? 그런 고민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말 어감사전을 읽는 동안 단어가 품고 있는 속뜻을 알게 된 것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단어의 씀이과 사용 그리고 올바른 장소에 놓아두어야 함을 느낀 책이다. 그러니까 책 속에 담긴 일부 단어를 통해, 우리말을 쓸 때 좀 더 정성껏 사용해야 할 마음을 새로 다 잡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