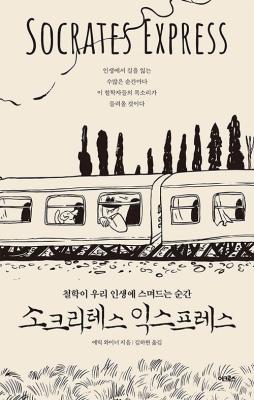이 책은 여러 철학자들의 철학을 소개하는 철학입문서이다.
인상깊었던 철학자는 니체이다. 니체의 도덕철학은 서양의 지배적인 도덕에 대한 비판과 비도덕주의에 대한 주장으로 구성된다. 이런 도덕철학의 내용은 도덕의 의미에 대한 물음, 도덕이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 물음을 니체는 서양의 전통적 자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이해한다.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에게 보여준 이래로 쇼펜하우어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도덕을 인간이 사유하고 행위하는 존재인 한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도덕은 자의성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인식과 행위를 정당화한다. 이것은 도덕의 유익한 점이다.
하지만 도덕이 인식과 행위를 정당화할 때, 그 정당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이 진짜 선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심해보지 않았다는 것, 달리 말하면 도덕 자체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채로, 도덕 자체가 이미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사유 전통에 대한 니체의 불만이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의심되지 않았던 도덕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도덕철학을 출발시킨다.
이러한 문제제기 방식은 전통적 도덕이 삶과 지양될 수 없는 모순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폭로하게 하고, 삶의 조건으로서의 도덕의 기능을 밝혀내게 하며, 새로운 유형의 도덕인 자유주의적 도덕이론을 구상하게 한다. 니체의 이런 프로그램은 형이상학 비판과 그리스도교 비판, 그리고 그의 인간관을 토대로 진행되며, 니체 철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도덕적 신념을 문제시하기 시작하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부터 시작되는 그의 도덕철학적 사유는 서양의 기존 도덕의 반자연성을 고발하고, 도덕의 자연성 회복을 선언하는 '우상의 황혼'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행된다.
'차라투스트라'를 도덕적 문제의식에서 조명하면, 1부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인 근본구별에 대해 총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서양의 도덕적 자명성을 위버멘쉬적인 삶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재조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신의 죽음에 대한 선언은 터부시되어 왔던 도덕적 자명성의 탈터부시 작업의 신호탄 역할을 한다. 2부는 선과 악에 대한 새로운 판단척도가 힘에읭 ㅢ지로 제시되고 있다. 힘에의 의지가 자기극복 의지이며, 삶의 상승과 강화를 원하는 의지이기에, 선과 악은 삶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된다.
3부는 삶의 차이가 도덕판단의 차이를 가능하게 하기에 상이한 도덕판단들의 차이를 상쇄시켜 보편적 도덕을 꾀하는 작업의 무용성을 진단한다. 도덕적 판단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긍정은 영원회귀 사유의 기능인 디오니소스적 긍정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4부는 개별적인 도덕판단의 차이와 조건성에 대한 인지를 자유정신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인정은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유형의 도덕의 근간을 형성한다. 제4부는 출판자가 붙지 않아서, 사비로 내야 할 정도로 세간에서 무시되었다.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독일어로 짜라투스트라)를 주인공으로 한 이 철학적 이야기는, 산에서 내려온 주인공이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영겁회귀의 사상에 도달하고, 그 두려움에 견디면서도 이 사상을 고지할 수 있게 되는 '위대한 정오'가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니체가 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시적 표현과 풍부한 비유로 '비극의 탄생'과 함께 가장 유명하게 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짜라투스트라'로 니체의 후기 사상이 시작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후기는 '힘에 대한 의지', 허무주의, 초인, 영겁회귀, '가치의 전환' 등 중심적 사상의 다소라도 연관된 서술을 지향하고, 다양한 변주를 가한 잠언이 쓰여졌다. 니체의 남언 중에는 독일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 몽테뉴, 모차르트, 하이네 등 경애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찬사도 있다.
힘에 대한 의지는 니체가 보는 유일 실재이다. 힘의지는 자신 안에 운동의 목적과 원인을 갖는, 항상 운동하고 작용하는 존재를 말한다. 이런 존재관은 생기존재론이라고 불린다. 힘의지는 니체 철학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일반과 제반 현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설명원리로 사용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