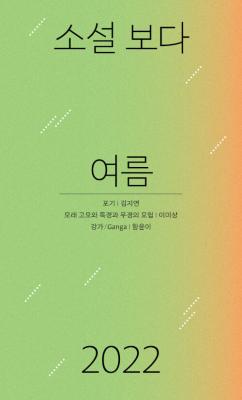소설과 작가인터뷰가 함께 있어서 더 재밌다. 다음은 작품 포기의 김지연 작가의 인터뷰 글 중 일부 이다. 평범함에 관한 것인데 소설보다 더 깊게 공감한 부분이다.
평범함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세계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격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어렸을 때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이었다. 역사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점점 향상될 거라고. 저의 어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진 게 사실이고 말도 안되는 악습들도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은 아니고 더 악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좀더 직접적인 계기는 자연환경의 변화이다. 이건 생활 환경이 지방에서 도시로 옮기면서 더 극명하게 느꼈다. 이 소설에서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미세먼지 지수가 최악인 날을 자주 맞이하며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그나마 반가워 하는 나를 발견했다. 보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로 희귀해져가는지 생각했다. 예전에 저는 평범함은 기본값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너무 익숙해서 거기에 어떤 가치판단을 할 생각조차 못 할 정도로. 파란 하늘이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파란 하늘에 큰 경이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런것들이 희귀해졌을까. 그렇다면 더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다. ㅏ제가 어렸을 때 마음 껏 누렸던 날씨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척 참담해집니다. 제발 만회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는 불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따져보다가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주위 어른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그만한 일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는 식의 답변을 받곤 했다. 인생이란 대체로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뭘 모르는 애송이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소설 속에서는 평범함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기는 하였지만 평범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어떤 집단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또 어떤 집단에서는 상당히 모자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평범한 것은 어때야 하는 사회적 압력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다만 살면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무엇인지에 대한 눈은 높아졌으면 좋겠다.
작품 모래 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의 작가 이미상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고모와 무경의 귀족적인 면모는 '할 수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줘서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그런 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인거 같다. 도식화하면 다른 사람의 'can/dislike'를 알아보는 눈 - can/dislike의 대리 수행- can/dislike를 대리해준 자신을 특별하게 보는 눈, 이 세가지를 갖춰야 할질도. 고모는 1,2,3을 모두 가졌고, 무경은 1,2,는 있는데 3이 있는지 모르겠고, 목경은 2만 가지고 있다. 셋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이 아닐까 한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알아보는 고매한 눈, 고모는 오빠부부의 곤경을 알아보고, 무경은 고모의 곤경을 알아보고, 두사람은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을까, 유전자의 신묘한 조합으로, 단순 시력으로? 그에 대한 제나름의 답을 이제서야 어렴풋이 찾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에는 그 답이 담겨져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1,2,3이라는 구분을 비롯해, 고모와 무경을 귀족으로 묶어주는, 제 표현으로 하자면 두 사람이 가진 고매한 눈을 가능케하는 조건에 대해 면밀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설을 쓸적에는 그저 목경과 똑같이 언니가 고모의 곤경을 어떻게 알아 봤을까,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두리번댔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다 쓰고, 또 질문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아차린 게 무엇이냐, 이 소설에 누락되어 있는 그게 대체 뭐냐, 묻는다면, 그것은 언젠가 다른 소설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더 안 상태에서 쓰면 그것은 다른 소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삼 질문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