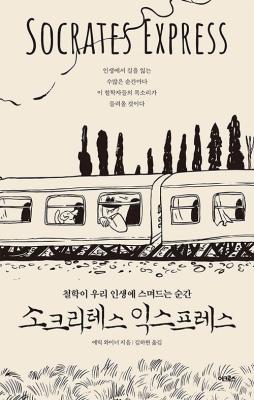이 책은 제목의 ‘익스프레스’가 눈길을 사로잡아 고르게 되었다. 마치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과 이념을 고속 코스로 빠르게 주입시켜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철학은 아무래도 고리타분하거나 지나치게 심오하거나 해서 일단 마음의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런 장벽을 모두 허물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적어도 이 책에 나오는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나 혼자 느끼는 친근감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
작가는 철학자들의 생가 혹은 그들이 좋아했던 장소를 여행하면서 동서양, 그리고 고대와 근현대를 넘나들며 다양한 철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을 소개한다. 그 철학자가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명망이 있어 이름을 본딴 온갖 장소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보존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작가는 꿋꿋이 철학자들의 생각의 흔적을 좇아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여정을 독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열차에 올라탈 수 있도록 계속 부추긴다. 작가의 그런 노력 덕분인지 나는 원래 원래 책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덧칠하거나 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몇 번 기어이 표시를 하고픈 욕망에 휩싸이곤 했다.
작가는 철학자들을 따라가는 여정을 새벽, 정오, 황혼의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고민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시작하고, 멋지게 늙어가는 법을 고미놘 시몬 드 보부아르와 늘 죽음에 대해 생각한 몽테뉴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소크라테스, 루소, 소로, 쇼펜하우어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은 모두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다시 질문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심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해나간 것 같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의 늪에 깊이 빠지기를 즐겼던 것은 삶, 인간, 자연에 대한 애정어린 시각이 있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또 많은 철학자들은 걷기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들은 걸으면서 떠오르는 온갖 상념을 지나치지 않고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파고든 것 같이 보인다. 나는 평소에 시간 내어 운동할 기회가 없을 때 머리를 비우는 용도로 무작정 걷곤 하는데 걷는 동안만이라도 아무런 생각도 하기 싫은 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잡하고 머리아픈 생각 말고, 명상하는 기분으로 나 스스로를 차분히 돌아보는 기회로 걷는 시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걸으면서 훌륭한 사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살을 붙인 철학자가 이렇게 많다니 말이다.
그리고 이 책의 철학자들이 보인 또다른 공통적인 태도 중 하나는 ‘수용’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 수동적이고 체념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많은 철학자들은 적극적 수용의 태도를 취한다. 잘 수용하는 것은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일어난 일,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객관화를 통해 온전히 나를 나로서, 상황을 상황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적극적 수용이다. 여러 철학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수용해야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 새겨야 할 삶의 태도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책의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인 황혼 후반부에서는 작가가 사춘기에 접어든 13세 딸과 프랑스를 여행한다. 딸과의 깊이있는 철학적 대화를 기대하며 떠난 여행에서 철학자들의 흔적을 좇아다니는 여행코스마다 작가의 딸은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지만, 때때로 본질을 꿰뚫는 질문과 한마디로 작가를 당황하게 한다. 시몬 드 보부아르의 이름을 딴 다리 앞에서 다리 구조가 철학적이라는 작가의 말에, 상상 생각 이라며 지나치게 철학하는 척 한다는 말에 정곡을 찔리는 장면도 인상깊었다. 결국 여러 철학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적 환영과는 거리가 멀다. 철학은 삶을 사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태도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단순하고 명료한 삶의 진리를 풀어 쓴 것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