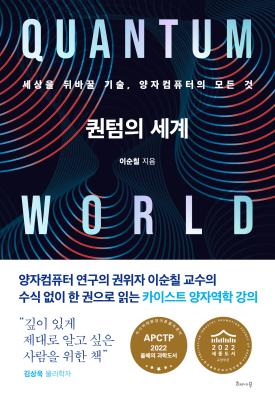현대물리학의 한 분야인 양자역학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이론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을 선택한 것도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읽고보니 결국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작가의 말대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더 이상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책을 선택하여 읽은 것만으로도 성공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더더욱 양자역학에 대하여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게되었다고 한다면 그 성공은 더 배가된 것처럼 느껴진다. 양자역학은 막스 보른이 처음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며, 양자(quantum)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라는 라틴어 quantus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양자역학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미시세계 뿐만 아니라 거시세계에서도 활용된다고 한다. 미시 시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물리량들이 언덕처럼 연속적이지 않고 계단처럼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 물리량이 이처럼 특정한 양의 양자를 통해서 기술된다는 특성을 보일 때 물리량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부른다.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물리량들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루는 역학에 양자역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다. 양자는 특정한 원소나 아주 작은 알갱이의 명칭이 아니라 일정한 양을 가졌다는 표현이라고 한다. 양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 단위와 비슷한 것이다. 물리량을 어떤 기본 단위의 정수배로 셀 수 있을 때, 그 기본 단위를 양자라고 부른다.
양자역학을 설명하고자 할 때 처음에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여러 사람이 기여한 이론이기도 하고, 생소한 개념이 많기 때문이다. 양자역학 발전 순서대로 시행착오를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이론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무지에서 시작하는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기에 이해가 쉬운 면은 있지만 양자역학의 계산방법을 익히는 데에 적합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 따라서, 보다 체계저긴 연역적인 스타일로 설명이 시도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양자역학이 필요한 이유나 양자역학 계산방법이 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곤 한다. 어떤 에너지나 물질이 계(system)내에서 불연속적이라는 주장은 현대물리학 등장 이전에도 있었는데, 가령 원자론도 실은 물질이 공간상에서 불연속적이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루트비히 볼츠만은 미 문제로 마흐나 오스트발트와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볼츠만은 통계역학에 미시적인 상태라는 가상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물리학에 불연속적인 개념들이 자리잡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1990년, 막스 플랑크가 자신의 흑체복사 이론을 전개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양자역학은 그 포문을 열었다. 다만, 플랑크는 흑체복사 현상에 한정하여 양자개념을 통계역학적 맥락에서 임시로 도임한 것이지 그 개념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플랑크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빛 그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광양자설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 여러 실험을 통해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진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그에 착안하여 드 브로이가 전자와 같이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파동적특성을 갖고 있다는 물질파 이론을 제시한다.
1913년 닐스 보어는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불연속적인 발머 계열의 수소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고안햇다. 이후에도 꾸준히 양자역학은 그 오랜기간 다양한 연구가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다.
여러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해 철학적으로도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철학적 논쟁은 실험으로 구현되지 못한다느 ㄴ한계로 인해 과학을 벗어나 철학 쪽으로 옮겨갔고 자연히 과학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논쟁의 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논쟁을 뒷받침할 만한 실험적인 결과물이 별로 없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을 광자나 원자 규모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양자정보과학이 발달하면서 양자역학의 해석도 현실적인 검증을 일부 고려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