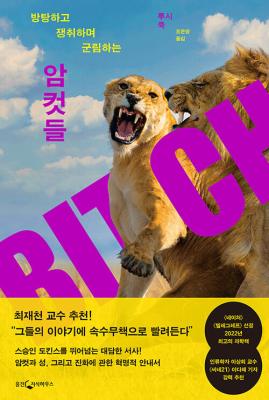출산율 0.78명 시대, 모성은 요즘 여성들은 물론 과학자들에게 관심 받지 못한 주제일지도 모르겠다. 동물의 암컷은 늘 어머니와 동일시되어 왔으며, 천성인 모성으로 육아에 헌신하는 존재로서 그려졌다. 모성은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영향을 받지만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케냐 킬리만자로에서 일곱 세대에 걸쳐 1,800마리가 넘는 노랑개코원숭이를 연구한 동물학자 진 앨트먼 프린스턴대학교 동물행동학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영장류에게 모성이란 ‘양육과 생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협상하는 줄타기’다.
흥미롭게도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이 임신과 수유의 세계에서 풀려나면 오히려 자식에게 헌신하는 주체는 주로 아빠다. 조류 대부분은 부모가 새끼를 함께 돌보고 양서류는 싱글대디, 싱글맘에서부터 공동육아에까지 다양한 돌봄 전략을 보여준다. 공동의 탁아소를 짓고 새끼를 키우는 백목도리여우원숭이를 비롯해 포유류의 3%는 남의 새끼를 돌보고 부양하는 알로마더, 즉 다른 엄마들의 절실한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 세계의 다양한 돌봄 전략은 인간이 그 어떤 유인원보다 크고 무력하게 태어나지만 훨씬 빨리 번식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다. 바로 돌봄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이 하나의 사회가 보호자의 역할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공감과 협력,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진화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다정함과 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모성본능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가 알로마더의 역할을 자처할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사회의 심각한 젠더갈등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지만, 암수 동물 사이의 성적 갈등은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진화의 엔진이 된다. 이 성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거미다. 번식기의 황금무당 거미는 교미를 시도하는 수컷을 슬러시로 만들어 흡입해버리고, 수컷은 죽어가는 와중에 정자를 발사시켜 번식에 성공한다. 번식이 양성이 합심하는 조화로운 과정으로 설명했던 다윈에게 팜파탈과 같은 암거미의 존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번식이 남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립하는 이해의 줄다리기 혹은 성적 갈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전자를 전달하고자 하는 수거미와 양질의 영양분을 흡수해 건강한 알을 낳고자 하는 암거미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 모든 성적 갈등이 누군가에게 치우친 권력 구조에서 벌어진 것은 아닐까? 가부장적 사회가 아닌 암컷이 지배하는 사회는 좀 다를까? 귀여운 외모로 유명한 미어캣은 모계사회를 이루는 대표적 포유류인데, 여왕을 제외한 다른 암컷이 수컷과 짝짓기를 시도한다면 무리에서 퇴거당할 뿐 아니라 잔혹하게 살해당하기 십상이다. 하위 계급의 암컷은 자신의 새끼를 죽인 여왕의 자손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형벌에 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간처럼 폐경을 하는 동물 중 하나인 범고래의 모계사회는 어떤가. 수십 년간 무리를 이끄는 나이 든 여족장은 자신의 생식 능력을 제한하여 젊은 암컷과의 경쟁을 피하고, 축적된 경험과 지혜로 무리를 이끈다.
저자는 동물을 이념의 무기로 휘두르는 것을 경계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의 암컷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무엇이 자연적이고 정상이며 심지어 가능한가에 대한 오래된 기본 전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믿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은 영장류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잔인한 개코원숭이의 문화는 남성 지배와 공격성을 설명했으며, 1970년대에는 침팬지가 인간 조상의 모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저자는 침팬지 사회에서 암컷의 권력이 과소평가되었다는 프란스 드 발의 목소리에 동의하며, 모든 권력을 거머쥔 그 어떤 알파 수컷도 배후에서 그를 밀어주는 암컷 킹메이커, ‘마마’가 없이는 무리를 지배할 수 없었다는 놀라운 발견을 주지한다.
이들 나이 든 암컷 침팬지는 모든 침팬지를 이어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모두가 찾는 중재자였으며, 암컷들의 우두머리로서 가족과 동맹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영장류 사회에서 권력은 신체적 우위뿐 아니라 경제적 레버리지(예를 들면 열매 위치를 아는 전문 지식, 번식에 대한 통제, 전략적 동맹 등)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 ‘마마’의 존재는 수컷이 지배하는 히말라야원숭이와 버빗원숭이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었다. 만약 침팬지 말고 다른 영장류를 먼저 발견했으면 인간 사회와 권력의 기원에 대한 이해가 뒤집혔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대안적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