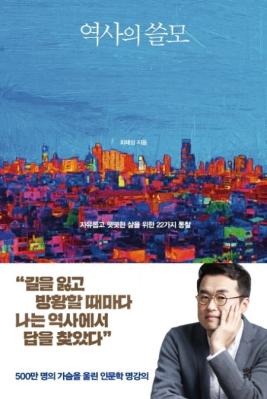저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출근길 자주 듣던 라디오에서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재미있게 역사를 설명해 주던 큰별 최태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신기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알고보니 업계에서 나름 유명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코너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나라 역사에서 협상의 달인으로 서희를 예를 들어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고려시대 외교가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몇마디 말로 전쟁을 막고 땅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서희가 재상으로 있을 때 고려는 송나라와 국교를 맺고 거란을 멀리햇더니 소손녕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 왔습니다. 80만 병사를 이끌고 와서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대군을 두려워하여 요구를 들어주자는 주장이 우세하였습니다. 지금의 평양의 북쪽 땅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때 서희가 반대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땅을 그냥 주자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장의 목숨도 중요하고 전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은자리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서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고려를 치려고 들어왔다면 대화를 하자고 요청을 하지 않고 서울가지 밀고 내려와야 하는데 대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그래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한다고 한 것입니다. 소손녕을 만나보니 고구려 땅을 달라고 하긴 했으나,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패를 보여주지 않고 상대방이 가진 패를 탐색하기만 하였습니다. 사드배치 당시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를 해버려서 중국과 마찰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서희와 소손녕은 자기 패는 보여주지 않고 상대의 패를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희는 거란족이 전쟁을 계속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싸울의도로 대군을 끌고 왔으면 얼른 공격을 해야하는데 땅을 돌려달라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쓸쩍 왜 가까운 거란하고는 교류하지 않고 송나라와만 친하게 지내느냐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진짜 속내였던 것입니다. 거란이 싸워야하는 나라는 송나라인데 거란 입장에서는 송나라와 고려가 친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거란이 송나라와 싸우는 도중에 고려가 거란의 뒤를 친다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거란의 패를 읽은 서희는 먼저 제안합니다. 여진족을 몰라내고 땅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거란으로 가서 왕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소손녕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고려는 이 회담으로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얻게 됩니다. 거란에 땅을 줘야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땅을 받아온 것입니다. 거란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거란 입장에서 강동 6주는 아주 작은땅인데 그것을 줌으로써 후방을 든든히 하였습니다. 협상이란 상대방과 내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상대방에 겁먹고 원하는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설계하고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협상의 진짜 기술입니다. 서희는 외교의 정석을 보여준 우리의 역사이자 조상입니다. 협상가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수산물 수입 금지조처를 취합니다. 일본정부는 이 조처가 부당하다며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합니다. 우리정부는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준비를 잘하여 2심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나 이를 반영치 못하였기 때문에 1심의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서희가 있었다면 우리시대에도 서희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려 전기에는 서희가 있었다면 고려후기에는 원종이 있었습니다. 몽골족과의 장기간 전쟁이 벌어져 고려가 힘든시기에 항복을 하러 원종이 몽골황제를 만나러 떠납니다. 가는도중에 몽골황제가 사망하여 후계자를 정하는 시기인데 고려가 항복을 하는 주체가 차기 황제로 옹립될 명분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된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명분을 주고 실리를 챙긴 것이 원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