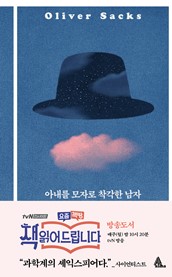1.상실
'결손'이란 용어는 신경학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신경 기능의 장애나 불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들면 이 말은 말소리 상실, 언어상실,기억상실,시각상실,정체성상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능의 상실 그리고 그 밖의 많은 특정 기능의 결함이나 상실을 지칭할때 쓰인다. 이 책 제 1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특수한 시각적 '인식불능증'의 예, 즉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일것이다 저자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임상보고는 고전적인 신경학에서 공리처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다. 기존의 견해에 따르면 뇌의 손상은 그것이 어떠한 손상이든 '추상적.범주적인 태도'를 마비, 상실시킨다. 이것이 마비 또는 상실된 인간에게 남는 것은 감정과 구체적.즉흥적인 태도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음악가 P선생의 경우에는 정반대이다. 그는 감정,구체성,개인적인 것, 현실적인 것 모두를 잃어버리고 추상적.범주적인 것만을 부둥켜안고 살며 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했던 것이다.
2. 과잉
신경학에서는 결손이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한다. 그러면 결손의 반대 상태인 과잉이나 잉여의 경우는 어떨까? 신경학에서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기능이나 기능체계는 기능하든지 기능하지 않던지 이 두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능의 과잉에서 오는 질환을 논하는 것은 신경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도전이다. 과잉을 고려하기 시작한 신경학자가 등장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과잉은 특별한 능력과 고뇌,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낳는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환자는 뭔가 이상하고 모순된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극도로 이상한 종류의 딜레마에 빠진다. 병을 유혹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자아가 병과 제휴를 맺고 한 몸이 되어 결국에는 독립된 존재이기를 포기하고 병의 산물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특히 자아가 약하거나 발달이 덜 된 환자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강한 병에 걸려 정신을 완전히 빼앗기거나 실제로 정신을 완전히 놓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
3. 이행
사물을 생각하거나 논하는 경우에는 항상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 두가지 영역을 뭐라고 불러도 좋겠지만 '물리적인' 영역과 '현상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것도 좋은 예이다. 요컨대 양과 형식을 문제삼는 영역과 사물의 질을 다루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생리학적인 것이나 신경학적인 것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도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런 때에 생리학 혹은 신경학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 없거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까지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쓸떼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며 무언가에 의해 규제된다. 그러나 우리는 신경기능과 신경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으로 윤리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라고 여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때때로 기질적인 병의 개입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떄는 생리학적.신경학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4.단순함의 세계
지적장애인들에게 특징적인 마음의 질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구체성이다. 그들의 세계는 생기있고 정감이 넘치고 상세하면서도 단순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기 떄문이다. 자연 만물의 본래 모습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오히려 반대이겠지만 신경학자들은 '구체성,구체적인 사상'을 열등하고 고려할 가치가 없고 통일성이 결여되었고 퇴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일단 뇌에 손상을 입으면 인간은 고상한 영역으로보터 인간적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낮은 '구체성'의 수렁으로 내동댕이쳐진다고 생각했다. 만일 인간이 '추상적.범주적인 태도'혹은 '명제적인 사고력'을 잃으면 도리없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며, 중요성도 없고 관심의 대상도 되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정반대라고 생각했다. 구체성이야말로 기본이다. 만일 구체성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 나오는 P선생의 경우가 '구체성'에서 전락해서 '추상성'으로 빠진 것이다. '뇌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훼손되지 않고 남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