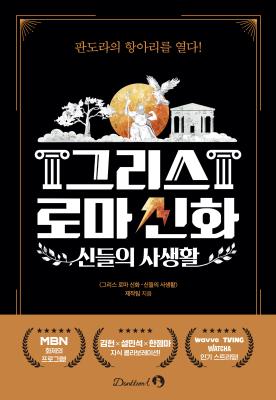그리스 로마신화(신들의 사생활, 판도라의 항아리를 열다)는 한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내용을 책으로 흥미있게 엮어서 출판한 책이다. 그리스 로마신화를 재미 있게 그리고 신화가 담고 있는 철학적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많은 작가들이 책으로 만들었고,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신화가 주는 흥미로운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이면의 내용까지 철학자에서부터 스토리텔링 작가까지 각자의 시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또 많은 해석들이 나올 것이다. 플롤로그에서 밝혔듯이 신화 이야기는 인문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많은 세대를 아울러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이야기이다. 신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철학의 어원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양 철학의 성지인 그리스와 역사의 근원지인 로마, 두나라의 신화를 살피고 파헤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신화의 많은 해석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읽어 본다면, 신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고 우리에게 되짚어 알려주고자 했던 목적인 우리를 계속 인간답게 사유하도록 돕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책은 모두 8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신과 함께에서는 신들이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 최초의 신인 가이야의 탄생에서부터 제우스가 권력을 얻어 최고의 신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절대권력을 두고 아버지와 자식간의 투쟁이 어쩌면 신화판 패륜 드라마가 아닌가 하겠지만, 학자들은 안락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를 넘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만 발전을 이루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두번째는 판도라의 항아리인데 프로메테우스와 동생 에피메테우스, 그리고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항아리를 열었다가 닫아을때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과연 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된 새로운 고문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희망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부부의 세계에서는 바람둥이 제우스와 헤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수많은 여신과 여성들을 유혹하고 바람을 피운 제우스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재미있다. 절대 권력자가 된 제우스는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하는 데 있어 협력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협력자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막장 드라마가 아닌 현실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노력했던 제우스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헤라의 질투인데 제우스의 바람때문에 힘들어 했던 헤라가 왜 질투의 화신이 되어 제우스의 외도로 태어난 많은 신들과 영웅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신성한 결혼의 지키는 신인 헤라의 입장에서 불륜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응징으로 질투의 화신이 되어 제우스 대신 그 자식들을 벌하다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영웅의 탄생인데 영웅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인물을 말한다.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버린 영웅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루며, 자신가 가진 힘을 권력을 얻는데 쏟기 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썼을때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섯번째 신을 넘는 녀석들에서는 신 보다 뛰어나다는 자만심을 가진 인간들의 최후를 다루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으면 신이 분노한다고 하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키메라를 무찔렀으나 신이 되고자 했다 번개를 맞은 벨레로폰, 베를 여신보다 잘짠다고 자랑했다 거미로 변한 아라크네 이야기를 다루었다. 분수를 지키지 않은 인간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일곱번째 저세상에도 꽃은 피고에서는 저승의 신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사랑이야기,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하데스와 6개월은 지상에서 6개월은 지하세계에서 보내야하는 에우리디케의 이야기는 읽는 재미를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승까지 갔으나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야할 때와 한번쯤 뒤돌아 볼 때를 구별해야 한다는 지혜를 주고 있다.
마지막 여덟번째 아프로디테의 두얼굴에서는 피그말리온과 아네모네(꽃말은 사랑의 괴로움)로 변한 아도니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다가갈 때 개인의 능률과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을 다루는 원동력이 사랑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를 끝으로 책을 마무리 하고 있다.
소설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은 이야기를 창작한 것처럼, 신화 역시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를 과학이 없던 시대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설명하려 했던 인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단순한 소설로만 보지 않고, 세상을 살아 가는 중에 필요한 지혜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오랜된 인류의 시도를 잘 활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