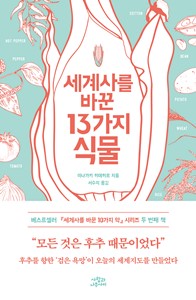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감자, 토마토, 후추, 고추, 양파, 차, 사탕수수, 목화, 밀, 벼, 콩, 옥수수, 튤립이 그 것이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처럼 이런 식물들 하나하나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바꾼게 아니라 특정시대마다 특정 식물에 인간의 들끓는 욕망이 모이고 강하게 투영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가는 서문에 모든것은 후추때문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바스쿠 다가마의 위대한 항해,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최초 세계 일주 탐험도 모두 후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페인과 포루투갈이 대항해시대를 활짝열고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건설한 것도 그 후 미국이 영국의 바통를 이어받아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승승장구한 것도 모두 후추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후추가격이 황금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당대 유럽에서 후루츨 손에 넣은 개인은 부를 쥐고 권력을 휘두릴 수 있었고 후추무역을 독점하는 국가는 경쟁국들을 제치고 독보적인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한다. 포르투갈이 바스쿠 다가마를 스페인이 콜럼버스와 마젤란을 지원하여 탐험을 떠나게 한 것도 인도에서만 생산된다는 후추를 독차지하고 싶은 검은 욕망의 발로 였다고 주장한다.
또, 감자가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아일랜드에는 감자역병으로 인한 대기근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대기근은 아일랜드에 100만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시 신천지로 여겨지던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그 수가 400만에 달했다고 한다. 그 시기 미국은 본격적인 공업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이 무렵 대기근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인은 노동자 집단으로 변신해 미국 공업화와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 시기에 축적한 부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미국은 당대 최 강대국 영국을 앞지르며 세계 최고 공업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 사람들 중에는 달 탐사계획을 추진한 주인공이자 제 35대 미국대통령이었던 존 F.케네디의 할아버지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과 세계 현대사를 만든 주역들 중 한명인 대통령 레이건과 클린턴, 오바마의 선조들도 있었으며 월트 디즈니와 맥도날드 창업자인 맥도날드 형제 역시 이민자의 후손이라고 한다. 저자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감자역병으로 인한 대기근이 없고 그로인한 아일랜드인들의 미국으로의 대이주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질문을 던져본다. 케네디와 레이건, 클린턴, 오바마와 같은 걸출한 미국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 미국과 세계는 지금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책을 보면 세계사의 드라마틱한 페이지는 항상 문제의 인물 콜럼버스가 등장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으나 손에 넣고 싶어 했던 후추는 발견하지 못하고 부하들과 몇날 며칠헤메이던 끝에 후추 대신 발견한 작물은 고추였다. 콜럼버스는 후추와 전혀 다른 작물인 고추를 후추로 속여 스페인에 보냈다. 콜럼버스에게 아메리카대륙은 인도여야 했으며 고추는 후추여야만 했다. 저자에 따르면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 섬들이 서인도제도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후추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고추는 Red Pepper, 피망은 Green Pepper, 파프리카는 Sweet Pepper로 영어명칭에는 후추를 의미하는 Pepper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하고 한다. 후추를 찾지 못한 콜럼버스와 스페인은 호사스러운 사치품인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에 주목했다. 아열대기후인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사탕수수를 카리브해 섬들이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해 보여 아메리카 대륙에 들여오기로 했고 그렇게 도입된 사탕수수는 후추를 대신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라났고 막대한 부블 창출했다고 한다.
인간은 언제나 식물을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여기며 이용해 왔으며 식물은 거부하지 못하며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살아야 했으며 강제로 이국땅으로 옮겨져 낯설고 거친 기후와 환경을 견뎌내야 하듯이 피해자로만 살아왔다고 저자는 생각하지 않는 다고 한다.
인간이 식물을 제멋대로 개량한게 아니라 식물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자유자재로 변신해온 것일 수도 있으며 다른 의미로는 인류는 지배자인 식물의 시중을 드는 가엾은 노예로 보이지 않을까로 마무리 하며 통념을 깨고 사고의 틀을 넓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