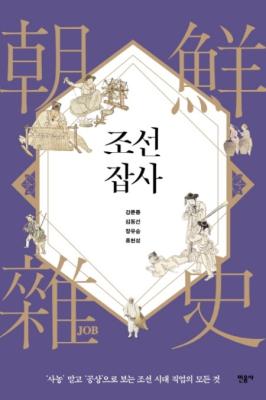조선잡사
처음부터 읽다가 중간중간 끌리는 부분 위주로 읽었다.
내가 소프트웨어 기술자다 보니 4부 기술자들 내용이 아무래도 만ㅎ이 끌리더라.
조선의 사기장-도자기 만드는 장인-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인데, 많이들 도망갔다고 한다.
고된 일인데다 나라에서 대접을 못받다보니 세습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통했나보다.
고려청자가 조선에 이어지지 못한게 참으로 안타가웄다.
조선의 도자기는 화려하지 않다.
혹지는 이르두고 검소하고 소박한 아름다움 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미학에 입각한 해석이다.
조선시대에는 벽에 희칠을 하는것도 사치로 여겨졌다,
만약 검소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흙빛 그대로인 질그릇을 썻을 것이다.
백자 원료인 백토늬 채굴과 운반이 백성에거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는 수많은 사료가
입증해 주고 있다.
소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것도 구분해야 한다.
실학자들은 문헌을 조사하다가 ㅈ고려펑자가 "비색자기"로 일컬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위문을 제기했다.
고려청자를 만들던 우수한 기술은 어디가고 우리는 소박한 백자빢에 만들지 못하는가?
우수한 기;술은 우수한 장인에게서 나오고, 우수한 장인은 우수한 대우에서 나온다.
장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면 기술은 발전하지 못한다.
조선의 도자기가 소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다.
조선 신료는 시계 제작자를 천시했다.
송이영이 혼천시계를 제작한 일로 승진하자 조정 신료들은 하찮은 기술로 승진 했다며 반발했다.
또 이들은 최천약을 두고 왜관에서 기술을 배워왔다면서 "왜노"라고 욕했다.
요샛말로 "쪽발이"였다.
조선의 시계 제작자는 정밀한 기계를 다루는 공학자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무에서 유를 일군 시대의 천재들이다.
그러나 조선의ㅣ 시계 제작자들은 천대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결국 조선은 19세기까지 바늘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 남게 되었다.
현대시대에 기억하는 과거 시계가 세종때의 물시계 - 자격루- 이외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도 이르렀다.
세종 후대에는 자격루가 고장나면 고칠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오죽하면
그 이후 500년 동안 시계발전이 멈추었나 싶다.
6부 조선의 전문작 이야기에는 조선의여러 전문직 이야기도 나온다.
'의사'가 나올줄 알았는데 의사는 없네.
숙사(입주 가정교사), 돋자리 짜는 노인, 회계사, 역관, 매사냥꾼 등등...
요즘 전문직- 시험을 통과한 자격증 보유자-과는 다른 개념의 전문직이더라.
매사냥꾼 응사에 대한 이야기 끝에 매가 오래 살게하는 비법과 그에 대한 코멘트.
무억보다 너무 자주 사냥을 시키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매가 지치기 때문이다.
꿩 3마리 잡으면 만족하고 더 이상 사얀을 시키지 않았더니 매가 오래 살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욕심을 부리지 않는것이 매사냥을 오래하는 비결이다.
아랫사람을 늦게까지 붙잡아놓고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지3년이 되었다.
출퇴근 할때는 주변에 회사원만 있는것 같았는데, 재택근무 하면서
근처 공원도 산책하고 동네마트에서 장도 보다보니 평일 낮에도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보게되었다.
생활하면서 현대 잡에 대한 시야를 넓힐수 있었던것 같다.
괴짜소리 많이 듣는 나는 요즘 세상에서 기술자로 살아갈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많은 기술자중에 '개발자'가 요새 몸값이 높아지면서 좀 어리둥절 하기는 하다.
10여년전만해도 3d 직업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변한것이다.
나는 소싯적에 52시간제가 적용 되었더라면 나도 야근수당/주말수당 넉넉히 챙겨서 일을 하더라도
좀 덜 억울했을텐데...
그렇게치면 이전에 주6일 근무할때에 보면 끝도 없긴 하겠지만...
개발자 수요는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규제, 타과 교수들 반발 등으로 컴공과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던 시업이 난다.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치고 올라올 후배들이 적어서 오래토록 이일을 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