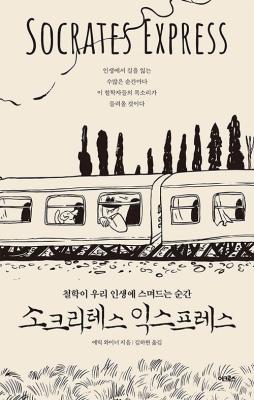이 책은 여러 철학자들을 마치 기차를 타고 역 하나 하나 들리듯 엮어서 풀어쓴 책인데 개인적으로는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니체 편이 인상깊었다.
좋았던 부분을 곱씹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의심했다. 글은 종이 위에 생기 없이 누워있으며 오직 한 방향으로만, 저자에게서 독자에게로만 움직인다. 책과 대화를 나누는건 불가능하다. 좋은 책도 마찬가지다. <대화편>에는 소크라테스와 여러명의 대화 상대가 등장한다. 이들은 예를 들면 정의나 용기, 사랑 같은 것의 의미를 두고 씨름한다. <대화편>은 건조한 논문이 아니다. 니체의 말처럼 "농담 가득한 지혜"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는 종종 화가 치밀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대화편>의 등장인물인 니키아스는 이렇게 말하다. "소크라테스 근처에 있거나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든 논쟁에 말려들기 쉽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든 간에 소크라테스가 졸졸 따라다닐 것이며, 결국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소크라테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단 소크라테스와 얽히면 소크라테스에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털리기 전까진 그를 떨쳐낼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대화 상대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며 소크라테스를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전기가오리에 비유한다. 소크라테스와의 대화가 좌절스러운것은 꼬치꼬치 캐묻는 다섯 살짜리와의 대화가 좌절스러운 것과 비슷하다. 아이의 질문이 성가신 것은 멍청한 질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제대로 대답할 능력이 없어서이다. 아이들은 소크라테스처럼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고, 그것은 길게 보면 도움이 될지언정 당장은 무척 짜증스러운 일이다. 소크라테스의 목적은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혀 일종의 지적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정원사였다. "마음속에 당혹스러움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것 만큼" 그가 좋아하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당혹스러움을 심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었다.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특히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종종 격양되곤 했다.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한 데에는 좋은 뜻이 있었다. 바로 선명한 시야를 위해서였다. 소크라테스는 검안사였다. 사람들은 잘못된 도수의 안경을 쓰고 돌아다닌다, 이런 실수는 당연히 보는 방식과 보는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왜곡된 현실을 유일한 현실로 착각한다. 좋은 질문은 그렇다. 사람을 단단히 부여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좋은 질문은 문제의 프레임을 다시 짜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좋은 질문은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할 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는 행위 그 자체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좋은 질문은 똑똑한 대답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침묵을 끌어내기도 한다. 고대부터, 스코라테스가 태어나기도 후러씬 전부터 인도의 현자들은 브라모디야 라는 시합을 펼쳤다. 이 시합은 늘 침묵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언어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말로 형언할 수 업ㅆ는 것을 직감할 떄 통찰의 순간이 찾아왔다.
쇼펜하우어는 매우 독보적인 염세주의자였다. 쇼펜하우어의 강점은 우울함이 아니라 우울을 설명하기 위해 쌓아올린 철학적 체계, 고통의 형이상이었다. 여태껏 염세적인 철학자는 여럿 있었지만 염세주의를 진정으로 파고든 철학자는 단 한 명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시계>제 전부 제시되어 있다. 오직 철학자만이 사랑할 제목이다. 겨우 20대 때 오나성한 이 작품을,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생각의 산물" 이라고 칭했다. 책의 첫 문장부터 상당히 특별하다. "세계는 내가 만들어 낸 생각이다" 이 문장은 쇼펜하우어의 오만한 발언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이 이 세상을 지어낸 저자라는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마다 자기 정신에서 현실을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그의 시계는 그의 생각이고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이다. 쇼펜하우어는 관념론자였다. 철학적 의미에서 관념론자는 이상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념론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세계 자체가 아니라 정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을 뜻한다. 물리적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 할 때에만 존재한다.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관념론자들은 오로지 우리의 인식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존재하지만 우리 정신의 구성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신에서 구성된, 인지적 세계를 경험한다. 이 세계는 실재한다. 호수의 표면이 실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면이 호수의 전부다 아니듯이, 인지적 세계 역시 실재의 일부만 나타낸다 호수의 깊이를 설명해 내지 못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찰나의 감각적 현상보다 실재적이다. 철학자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에 다양한 이름을 붙였다. 예지체, 이상적인 형태의 세계., 브라만등이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개념은 동일하다. 쇼펜하웅어는 이 세계 너머에 있는 세계 개념을 지지했지만 여기에 우울한 자신만의 생각을 덧붙였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힘을 의지라 칭했다. 의지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요구는 고갈될 줄을 모른다. 모든 욕망이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그 갈망을 가라앉히거나 그 요구에 끝을 맺거나 그 심장의 끝없는 나락을 채우기엔 세상의 그 어떤 만족도 충분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