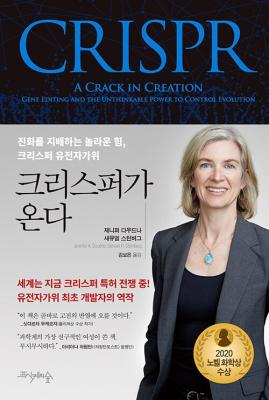본서는 노벨상 수상자인 분자생물학 대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가 2018년 출간한 "A crack in creation: Gene Editing and the unthinkable power to control evolution" 을 번역한 책이다. 번역이 완벽하지 않고 곳곳에 비문이 들어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제목 자체를 번역자가 임의로 바꾸어 "크리스퍼가 온다" 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큰 단점이지만 원서 자체가 워낙 분자생물학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의 일부 실수가 가려지기도 한다. 아무튼 원서의 제목이 정확하게 반영하듯 이 책은 인간이 유전자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조작하는 기술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길에 접어들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풍부한 임상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목에서처럼 유전자 변형, gene editing이 결국 진화를 콘트롤 (control evolution) 할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저자는 본서의 첫 장에서 매우 복잡한 중심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며 DNA에서 RNA, 다시 단백질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유전저보의 흐름은 분자생물학의 중심이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게놈 (genome)은 1920년 독일의 식물학자 한스 빙클러가 제안한 단어로서 유전자 gene과 염색체 chromosome의 합성어이다. 게놈은 세포속 유전정보의 총체를 가리키려는 의도로 탄생되었을 것이다. 때때로 발생하는 돌연변이는 예외지만 게놈은 대개 한 개체안에서는 어느 세포에서나 모두 같은 형태이며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고 개체를 유지하며 후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하도록 지휘한다. 게놈은 데옥시리보핵산 즉 DNA라는 분자로 구성된다. DNA는 오직 네개의 기본 물질로 이루어진다. 이 기본물질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며, 염기를 상징하는 A, G, C,T라는 약칭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를 나타낸다. 이 분자들은 한가달으로 길게 이어지며 두 가닥이 만나면 이중나선 구조의 DNA를 형성한다. DNA의 염기서열은 세포 안에서 특정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설명서와 같다. DNA에 있는 정보를 단백질로 바꾸기 위해서 세포는 이 과정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매개분자인 리보핵산, 즉 RNA를 이용한다. RNA는 DNA 주형에서 전사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번역과정에서 세포는 보통 유전자라고 부르는 분절된 형태의 DNA암호에서 생성된 기다란 RNA가닥을 이용해 단백질 분자를 생성한다. DNA에서 RNA, 다시 단백질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유전저보의 흐름은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이며, 생명체를 만들고 서로 소통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게놈 염기서열 분석이 유전질병 연구에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는 진단기술에 불과할 뿐, 치료법은 아니었다. 유전질병이 DNA언어로 기록된 방식은 알수 있었지만 잘못된 언어를 고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과학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도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처음에는 바이러스를 통해 유전자 삽입을 시도했으나 기대만큼 효율적인 도구가 아닐수 있음을 발견해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중나선 파손모델을 이용하여 유전자 편집을 시도한다. 이중나선 파손모델이 맞는다면 유전자를 편집하려는 정확한 위치의 게놈을 잘라 유전자 편집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 된다. 먼저 결함있는 유전자를 잘라 DNA 이중나선을 파괴한 이후 교정한 유전자 서열을 집어넣어야 한다. DNA가 파손되면 세포는 서열이 일치하는 염색체를 찾아 복제해 손상을 복구하려 하는데 이때 합성한 유전자가 슬쩍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DNA가 자연적으로 손상된 것처럼 세포를 속이고, 새로운 DNA를 짝이되는 염색체로 위장시며서 세포가 파손된 부위를 수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후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라는 기법이 발견되었으나 이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닌 편집기술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CRISPR 크리스퍼가 나타나게 된다. CRISPR은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의 약자로서 세균 DNA의 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크리스퍼 분야의 연구는 숨막힐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양적으로 충실히 축적되는 논문들을 바탕으로 세균의 복잡한 방어체계와 유전자 편집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다. 완벽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