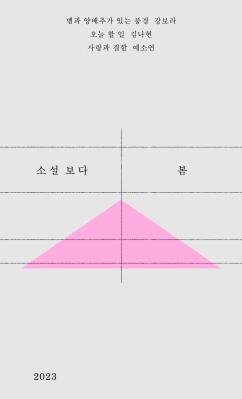1. 책은 매 분기마다 발간되는 문예지로 보여진다. 책의 목차를 보면 ‘뱀과 양배추가 있는 풍경’, ‘오늘 할 일’, ‘사랑과 결함’이라는 세 가지 짧은 단편소설을 담고 있다. 각 소설은 70페이지 내외의 짧은 단편 소설이며, 작가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뷰한 내용들이 각각의 소설 뒷편에 수록되어 있다.
2. 소설은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법한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허구 속에서 다시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같은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덤이다. '뱀과 양배추가 있는 풍경'도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것 같다. 작가에 따르면, 오래전 우붓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고, 그떄 사파리 리조트에서 본 코끼리가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새벽에 자다가 깨서 깜깜한 리조트를 어슬렁 거닐던 코끼리 소재로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소설을 읽는내내 뭔가 몽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설에서 '나'오 '현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놀이를 즐긴다. 과거 패션잡지 에디터였던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일까? 작가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가 흐릿해짐과 동시에 갈등이 더 은밀해졌다고 말한다. 이는 곧 내 생활습관, 즉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보는지가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타자화되어 구별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한 내용을 보며, 최근의 유투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대 힙스터'와 '신도시 부부'같은 콘텐츠가 떠올랐다. 스테레오타입으로 타인을 특정 부류로 묶고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꼭 소설속의 주인공들이 하고 있는 작업같았다. 사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다만,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하더라도 조소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3. 두번째 소설 '오늘 할 일'은 소설속 부부인 '나'와 '선일'이 다이어리에 내일의 계획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선일의 신념에서 비롯된 행동인데, 내년에 담당할 큰 규모의 프로젝트까지 얼추 업무 리스트를 작성해둘 만큼 선일은 계획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일이 사람 맘처럼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된 사건이 발생한다. 진행 중이던 사업에서의 이슈로 인해 선일이 퇴사와 진로변경을 결정하게 버리게 된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 있어 하루의 작은 계획마저 꼭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다이어리에는 지워지지 못하고 다음달로 이월되는 계획들이 더 많으니 말이다. 인터뷰에서 작가는 '삶은 통제되지 않는 것' 혹은 '삶은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사실 계획을 세우는 일이란 통제되지 않는 삶을 손에 쥐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듯하다. 작가의 경우 지키지 못할 계획이라고 일단 종이에 써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행동들은 사실 '삶이 예상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소망'과도 같다. 선일이 미리 업무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발생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소설이 시작하면, 계획은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희미한 것이 되어 있게 된다. 나와 선일 모두 계획에 무심해지지 않으면 더 크게 좌절하리라는 두려움을 학습한 상태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데 임신을 했을까 마음을 졸이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게 아닌가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쁜 짓을 한건가 스스로 의심하면서 결국 그들이 삶의 방향을 숙고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기에, 이러나저러나 별로 상관없는 ‘오늘 할 일’리스트를 만든건 아니었나 싶다. 그러고 보면 나와 선일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새로운 소망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든다. 작가의 말처럼 사람도 삶의 방향이 틀어진다해도 자기답게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게 아닌가 긍정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