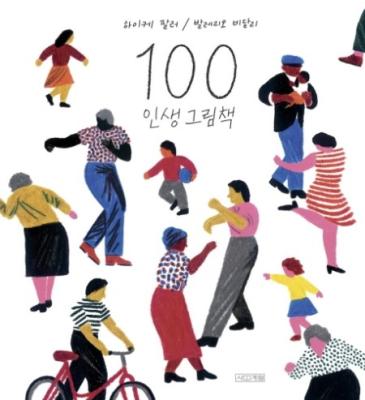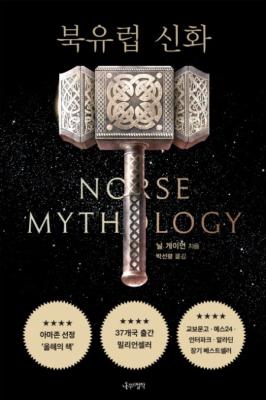2020-12-13
류주은
북유럽 신화
0
0
우리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내며 세상을 살아간다. 똑같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도 시인은 시를 쓰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며, 농부는 수확을 준비하듯, 우리는 각자 다른 시선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해석하고, 창조해낸다. 음유시인들의 입에서 오고 갔던 북유럽 신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시 고대인들은 이유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두렵고, 인간의 감성, 지성 등의 원천이 궁금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재해를 관장하고, 인간에게 사랑, 질투, 시기 등의 감정을 불어넣는 존재들을 "신"으로 상정하고, "신"들의 이야기를 음유시인의 입을 통해 만들어냈다. 자본, 직급, 성적처럼 계량화되고, 가시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신화는 다소 허무맹랑한 망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인간의 근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특히 북유럽 신화는 북유럽에 살던 고대인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선, 고대 북유럽 사람들의 신은 매우 강한 존재이나, 인격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속임수에 능통하다. 최고신으로 불리우는 오딘은 9일동안 이그드라실이라는 세계수에 매달리고, 눈 한쪽을 미미르의 샘에 바친 대가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나 오딘은 크바시르의 피로 만든 꿀술이 매우 달콤하고, 음악적 영감을 준다는 소문을 듣자 사기를 치고, 거인여인 군도르를 꾀어낸 뒤 속임수로 꿀술을 빼앗아간다. 엄청한 힘을 가진 토르는 난장이 브로크와 에이트리가 만든 망치가 없다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토르는 멍청하고, 단순하며, 큰 솥을 얻기 위해 죄 없는 거인들을 살육해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 외에도 미의 여신 프레이야는 수많은 신들과 염문을 뿌리는 개방적인 여신이었고, 속임수의 대가인 로키는 거인의 말 스바딜파리를 유혹하여 슬레이프니르라는 망아지를 낳기도 한다. 북유럽 사람들은 거칠고 추운 자연 속에서 살아왔고, 그들의 사회는 철저한 "힘"의 논리로 움직였을 것이다. 항상 풍요로운 땅을 약탈하고, 빼앗았던 북유럽 사람들에게 고상한 도덕과 규율을 지키는 신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도덕이자, 규율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북유럽의 신들은 필멸의 존재이다. 북유럽 신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는 "라그나로크"이다. 지혜의 신 오딘은 로키의 괴물 자식들에 대한 꿈을 꾸는데, 바로 그들이 신들의 세계 아스가르드를 멸망시키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딘은 로키의 자식들을 죽이거나, 추방하는데, 결국 라그나로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신화는 처음부터 멸망이라는 끝을 향해 달려간다. 신은 응당 죽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북유럽 신화의 신들은 멸망하게 된다. 다만 그들은 잔혹한 라그나로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싸우다가 멸망하게 된다. 또한 라그나로크 후에는 죽음을 당했던 발드르와 호르라는 신들이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다. 이를 보았을 때 북유럽인들에게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으로 보인다. 항상 몰아치는 대자연 앞에서 영원한 생명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을지 모른다. 대신 그들은 "영원한 명예"를 통해 불멸의 존재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생명은 사라지더라도 명예로운 죽음을 통해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면, 이것이 바로 신과 같은 영원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북유럽의 신들은 매우 흥미로운 존재이다. 욕망에 충실하며, 강한 승부욕을 지니고 있고,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누구보다도 불꽃 같이 화려했던 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북유럽 신화가 더욱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것일지 모른다. 인간을 창조하였지만, 결국 필멸하고, 후세 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북유럽 신들은 대자연 앞에서 늘 굴복할 수 밖에 없으나, 명예로운 죽음으로 후세에 이름을 남겼던 북유럽 전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