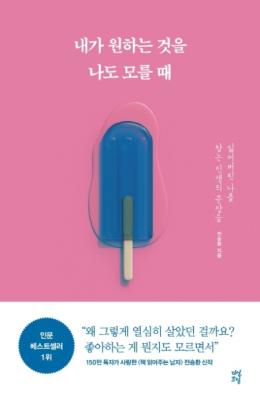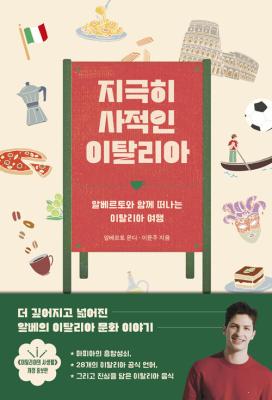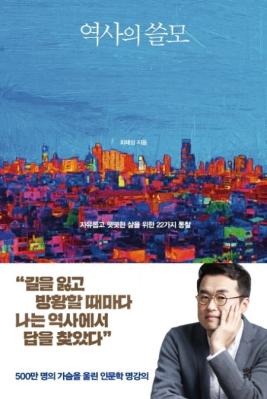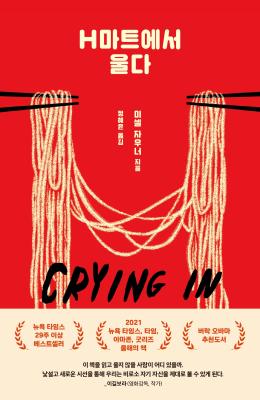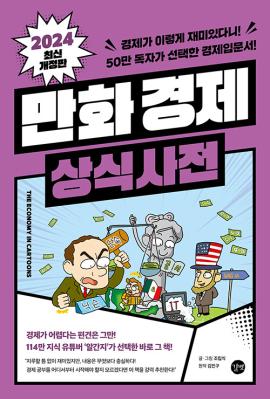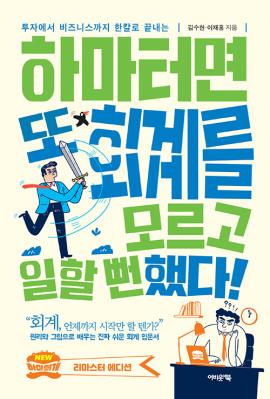2024-09-12
김은녕
노화의종말
0
0
100세 인생이 멀지 않은 현재, 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80세까지 사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100세까지는 살고 싶지만, 노년의 대부분을 병상에서 혹은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막대한 병원비나 시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가?
데이비드 A. 싱클레어의 '노화의 종말 (원제" Lifespan : Why We Age - And We Don't Have to)'에서는 긴 수명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 전, 오랜 치료 과정에서의 '인간성 상실'에서 기인된다 한다. 사실은,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영생을 꿈꾸는 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대공황 이후 하나둘씩 생겨난 사회보장제도가 생겼을 당시에는 60대 이상의 인구가 겨우 7% 수준이었고, 후대들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인원도 많았다, 그러나, 가까운 근래에 전인구의 50% 이상이 60세인 국가의 출현도 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오래전에 만든 사회보장제도가 늘어난 수명하에 존속 가능한가? 젊은 경제 인구들이 그들 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인들을 보양해야 하기에, 이러한 연금제도나 사회 보장제도는 붕괴될 것이고, 그리고 노인의 의학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에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들이 늘어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노년의 질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40~50대의 젊은 삶을 유지한다면, 노년 인구는 사회의 짐이 아니라, 활력적인 경제 인구로 재탄생할 것이며, 사회 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지구의 문제 해결, 가령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을 복원시키는 것이나, 지구 온난화를 개선할 미래 에너지원 확보 등에 재원을 더 투자하는 사회적 선순환을 이끈다면 좋을 것이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며, 120세까지 건강한 노년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화를 최대한 감속시켜주는 것이 현대 의학의 한계라면, 실제 나이보다 젊어질 수 있는 노화연구의 결실로, 활력적인 노년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 꿈만 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러기 위헤서는 우선 노화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늘어난 수명에 부합하는 법제 체제가 필수로 필요하다. 그리고, 노화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회적 이해도 중요하다고 한다.
노화의 원인은 세포 내 후성유전체들이 잦은 DNA 분열로 끊어진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가 수선 후에 되돌아오지 못하는 세포 회로 시스템 교란 현상으로 인한 좀비 노화 세포의 증가라고 한다. 흔히들 알고 있는 분열이 지속되며 DNA의 자체의 교란이나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후성유전체들을 활성화하는 AMPK 활성 인자, TOR 억제 인자 등의 조절로, 오히려 젊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메트포르민, NAD 증진제, 라파마이신 유사 물질 등은 후성유전체의 역할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세포 내 유전적 인자들의 직접적인 연구 외에도, 주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DNA를 분석하고,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고, 누구나 개인 생체 감지기를 이용하여, 근본적으로 상태가 악화되기도 전에 노화나 질병의 시작 지점에서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다가, 병을 앓고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화를 이겨내고 오히려 젊어지는 연구의 진보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 시각이 존재한다. 노인이 늘어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과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이 훼손하는 도덕적인 의문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노화를 질병으로 정의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노화에 대한 장기 연구 투자를 지원 가능할 것이며, 덜 아프게 하는 의료 서비스 차원의 노화 연구가 아닌, 젊은이와 같은 활력 있는 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비대해져가는 병든 노년 인구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 들어갈 자원을 전 지구적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소비 문제를 줄이는 쪽에 우회 투자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선순환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전하고 있다.
늙으면 죽는 것을 당연함을 받아들였는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최대한 오래 건강한 삶을 살다 죽을 수 있다면, 본인은 물론 자식들에게도 축복일 것이다. 그런 날이 분명 온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어서 기뻤다. 마치, 새로운 삶을 얻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책이었다.
로마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아주 짧고 초조한 법이다"라고. 이 책을 통해, 인간 수명의 과거와 현재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니, 죽음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주인공은 해가 갈수록 어려집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스트럴드브럭'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허구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젊고 건강한 몸으로 100세를 훌쩍 넘긴 삶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비롯한 억만장자들은 이미 관련 분야에 투자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곧 그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자세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고 싶냐는 질문과 단순히 몇 살까지 살고 싶냐의 대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 죽는 것보다 노화로 겪게 될 병, 고통 같은 노화의 과정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런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노화를 연구 중인 데이비드 싱클레어의 <노화의 종말>입니다.
장수와 활력의 근원, 서투인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화의 결과를 치료만 했지 노화 자체를 없앨 생각은 못 했습니다. 노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타고나는 것'과 후천적으로 익히는 '후생유전자'가 있습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다르게 10~25% 수준입니다. 후생유전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후생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전정보를 보관하게 도와주고 컨트롤하는 물질이 있다면 노화가 치료될 수 있을 겁니다. 저자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작용을 하는 '서투인(sirtuin)'입니다. 서투인은 우리 몸의 '번식'과' DNA 수선'을 제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번식 대신 DNA 수선에 집중합니다. 질병과 맞서 싸우게 할 뿐 아니라 세포의 활력을 높입니다.
즉, 노화는 DNA의 정보가 손상되는 것인데 '서투인'이 손상된 DNA 정보 복원을 도와주고 노화를 예방한다는 말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나이 들면서 활성이 줄어드는 서투인을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서투인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몸에 가벼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간헐적 단식, 고강도 운동, 저 단백질 섭취 그리고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되는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생활 가운데 방법 말고도 약을 통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합니다.
책 말미에는 자신이 직접 먹는 약을 소개합니다. NMN이나 레스베라트롤, 메트포르민 등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나올 수 있는 기술들도 소개해 줍니다. 그중에는 세포를 젊은 후성유전체로 되돌리는 재프로그래밍 기술이 현재 실험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쥐의 시신경을 다시 젊게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벤자민이 되어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가상의 영화가 아니게 됩니다.
저자는 금세기 말쯤엔 세포 재프로그래밍으로 인간이 150년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재 120세를 넘겨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자의 주장을 검증하려면 적어도 수십 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다음 세기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다음 세기는? 언젠가는 150세까지 젊고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해지는 날이 올 거란 저자의 예측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수명은 40세 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