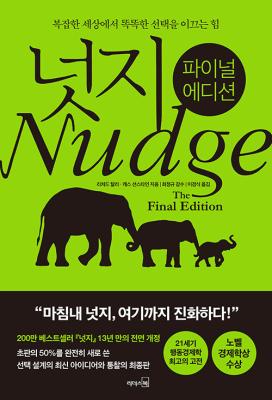2023-07-30
신지훈
묻히지 못한 자들의 노래
0
0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이번에는 빌 게이츠씨가 추천하는 책 말고 버락 오바마씨가 추천한 책을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과학서적보다는 소설을 읽고 싶은데, 지난 분기에 한국 소설가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외국 소설가의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작가는 특이하게, 조조, 레오니, 리치라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각 장의 제목으로 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 장의 이름의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그 장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이야기의 흐름에 집중하고 생각하면서 일게 만든다.
이 책의 첫 부분은 이 책에 나오는 가족들 중 가장이라고 할 만한 조조의 아빠가 미시시피주 시골에서 사는 모습이 많이 묘사되었는데, 이 시골생활의 모습 때문에 책 중간 중간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소설의 시대배경이 1700년대, 혹은 1800년대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소설은 가난한 흑인 가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지 못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특히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그렇게 심한 차별을 받았었던 것인가란 생각이 자주 들만큼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글 전반에 기술된다.
최근 한강 작가 소설을 읽어서인지 이 소설이 주는 느낌이 한강 작가의 소설, 특히 소년이 온다 혹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을 때 느꼈던 처연함 혹은 비참함과 비슷했고 무엇보다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알 듯 말 듯한 몽환적 분위기도 느껴졌다.
특히 이 책의 6장.리치를 읽어보면 그렇다.
그 소년은 리버의 아이다. 나는 안다. 그가 들판에 들어서자마자, 그 작고 녹슨 붉은색 차가 방향을 틀어 주차장에 나타나자마자 나는 그의 냄새를 맡았다. 내가 냄새로 그를 발견했을 때, 뒷좌석의 그 짙은 피부의 곱슬머리 소년을 발견했을 때 온 천지의 풀이 떨며 신음했다. 그에게서 강바닥에서 진흙과 하나가 되어가는 나뭇잎 향이 나지는 않았지만, 물과 침전물과 게, 물고기, 뱀, 새우, 조그만 죽은 생명들의 뼈가 가득한 늪지 바닥의 향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가 리버의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 늪의 바닥만큼 새카만 눈. 리버처럼 곧고 진실하게 뻗은,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꼿꼿한 뼈대. 그는 리버의 아이다.
차로 돌아온 그에게 나를 소개했을 때 나는 그가 리버의 아이라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었다. 그가 아픈 금발 소녀를 안고 있는 모양을 보고 알았다. 자기가 소녀를 감싸 안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뼈와 살을 방패 삼아 어른들로 부터,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과 풀이 무성하고 무덤들이 있는 드넓은 땅으로부터 소녀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리버가 보호하듯이 소녀를 보호했다. 나는 말해 주고 싶었다. 얘, 넌 못 해.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접어 차 바닥에 앉았다...
나는 소년에게 그를 낳은 사람을 내가 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를 소년보다 더 먼저 알았다고. 그가 리버 레드라고 불리던 시절에 내가 그와 알고 지냈다고. 총받이들은 그를 그의 부모님이 지어준 대로 리버라고 불렀다. 그들은 또 그가 강처럼 쓰러진 나무와 그루터기를 넘어 푹풍이 불 때나 해가 비칠 때나 모든 것과 함께 흘러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피부색 때문이라면서 레드라는 성을 붙였다. 그의 색깔은 강둑의 붉은 점토색이라면서...
차 안의 소년에게 이 말을 해 주고 싶었다. 그의 아빠가 나를 자꾸자꾸 구해주려고 했었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조조는 금발의 소녀를 품에 안고서 그의 귀를 갖고 노는 소녀에게 속삭였다. 뱃전을 핥는 잠잠한 만의 물결 같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나는 그의 피 속에 또 다른 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바로 리버와 다른 점이었다. 그 향은 강바닥의 진흙 향보다 더 짙었다. 짜디짠 바다의 소금향이었다. 그 냄새가 소년의 혈관 속에서 고동쳤다. 그래서 저 꼬마 소녀 빼고 다른 이들은 나를 볼 수 없는데, 그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 앞으로 흘러가는 강물 뒤 엔진도 노도 없는 배에 실린 어부처럼 속수무책으로 그 고동에 이끌렸다. 하지만 소년에게 그런 것은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차바닥에 널브러진 구겨진 종이들과 플라스틱 조각들 속에 자리를 잡았다. 비늘 덮이 새처럼 웅크리고 앉았다. 불타는 비늘을 주먹 속에 쥐고, 기다렸다.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타까움, 슬픔, 가슴저림이 느껴지면서도 죄송하게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도 든다. 슬픔이 주는 결과물일까. 언제쯤엔가 인간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공격하지 않을까.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 차원까지 갈 필요도 없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