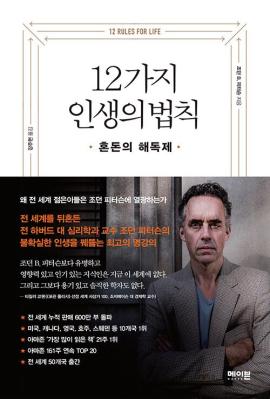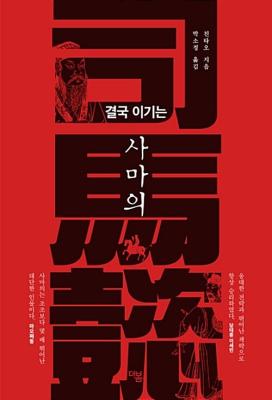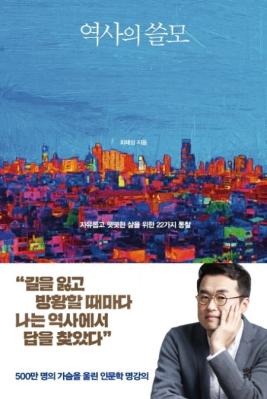2020-09-05
전성민
결국 이기는 사마의
0
0
결국 이기는 사마의가 결국 패하는 사마씨를 만들다
1990년대 중반은 출판만화의 전성기였다. 주간지로는 학산문화사의 찬스가 기존의 아이큐점프, 소년챔프를 추격하던 시기였다. 드래곤볼Z가 견인하는 아이큐점프와 슬램덩크가 버티고 있는 소년 챔프를 당시의 찬스는 쉽사리 넘어설 수가 없었다.
그 무렵 찬스는 타임슬립이라는 설정이 가미된 전혀 새로운 분위기의 삼국지인 용랑전을 연재하였고, 당대 소년들은 출판물 또는 TVA로 보아왔던 橫山光輝의 삼국지에 친숙하였기에 삼국지연의의 번외편 같은 용랑전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용랑전은 난세를 수습하는 사명을 가진 ‘천운의 상’이 멸망을 부르는 ‘파황의 상’인 사마중달에 맞서는 내용으로, 魏蜀吳 삼국을 멸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작품 내 각종 사건의 배후로 등장하는 인물인 사마중달이 이번에 리뷰해야 하는 <결국 이기는 사마의>의 주인공이다.
그의 일대기를 그린 본서에서 만나본 사마의는 1990년대 소년이 출판만화에서 본 사마중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거악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아니라 난세에 생존하려면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고, 일흔살에 고평릉사변으로 魏의 실권을 장악하기 직전까지 칭병하며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인물이었다.
한편 만년에 가까워질수록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오버랩될 만큼 정적이 스스로 몰락하도록 유도하는 교활한 면모도 강하다. 어쩌면 그는 난세에는 ‘천운의 상’, 치세에는 ‘파황의 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본격적으로 사마의를 알아보기 전에 그가 살아야 했던 시대를 간략히 살펴보자. 후기에 접어든 後漢의 정치세력은 외척, 환관, 청류파로 분파되어 있었다. 청류파는 태학의 정착으로 유학적 소양을 지닌 계층이 향거리선제를 통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환관 등을 탁류파로 지칭하고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환관이 주도한 당고의 금으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외척이나 환관과 유대가 있는 일부 청류파(원소, 조조가 대표적이다.)만 남았다.
한편 외척인 대장군 하진은 환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변방을 수비하던 동탁을 낙양으로 불러들이려고 하였고, 환관 십상시는 생존을 위하여 하진을 살해한다. 동탁이 낙양으로 입성하려는 혼란기에 청류파 중 무력을 보유한 원소 등은 십상시를 참살하고, 후반의 3대 정치세력 중 청류파만 남게 된다.
동탁의 낙양 장악, 외척 및 환관세력의 몰락, 동탁토벌에 참가한 손권, 유비 등 신진 무장세력의 대두로 국가가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後漢의 기풍은 무너졌다. 사회풍조는 악화되고, 保國安民은 시대착오적인 가치가 되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治世能臣 亂世姦雄이라는 조조에 대한 평가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 姦雄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러한 서기 170년대에 출생한 이들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였다. 이는 사마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사마의가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사마의는 타산지석의 태도를 갖추었다. 조조의 1세대 참모 중 대표주자는 순욱이었다. 순욱은 여포 격퇴와 원소와의 대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조조가 魏公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순욱과 조조는 고생은 함께 할 수 있으나 기쁨은 함께 할 수 없었다. 순욱은 조조가 後漢의 周公 旦이 되리라는 기대로 보필했으나 조조는 찬위를 꿈꾸었다. 조조의 야심이 구체화되는 순간부터 순욱의 입지는 좁아져갔고, 자결을 택하게 된다.
사마의는 이 사건을 통해 조조의 휘하에서 생존하려면 조씨일가의 찬위에 동조하고, 그 과정에서 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조조의 후계자인 조비의 충직한 가신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 이후 兵部로의 진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초패집단이 수행한 적벽대전, 蜀漢과의 전쟁 실패을 반추하여 曹魏가 물자에 있어서 우위에 있음에 착안한 교착전 위주로 구도도 설계하여 제갈량을 북벌을 저지하고, 兵部의 실력자가 되었다.
둘째, 사마의는 기회가 보장되는 자리를 끝없이 추구했다. 사마가문은 司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무관가문이었다. 사마의의 고조부인 사마균은 무인이었으나, 증조부인 사마량代에는 말에서 내려와 경서를 읽기 시작했다. 부친인 사마방代에는 조조를 휘하 관료로 발탁하는 등 청류파 관료로서의 입지를 확보했으나, 난세가 도래하자 무관의 가치가 상승했다.
사마의는 曹魏에서 오랜기간 문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군권은 초패집단. 즉, 조조의 혈족인 조씨와 하우씨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외 가문의 진입은 허락되지 않았다. 난세에는 병권을 가진 자가 유리함을 알았던 사마의는 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였고, 47세에 이르러 병력 5천명을 지휘하는 무군대장군 겸 가절에 임명된다.
이때부터 사마의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다. 그가 군부의 실력자가 된 것은 하우상의 병사, 조진의 전사로 초패집단 내에서 兵部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재가 소진되는 우연에 비롯한 것이었으나 필연이기도 했다.
사마의는 전란이 계속되는 시기에 전사 등으로 초패집단만으로 군부 지휘부를 구성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경력을 갖추기 시작하여 마침내 47세가 되어 기회를 얻었다. 군부에서 그는 맹달, 제갈량을 격파했고, 요동의 공손연을 제압하여 曹魏의 2인자 자리를 굳혔다.
셋째, 사마의는 은원 및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이 탁월했다. 燭吳의 갈등을 유발하여 손권이 관우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이 원한으로 추후 양국이 동맹을 형성하여 曹魏에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대내적으로도 조진의 子인 조상이 실권자가 되었을 때 조상일파에 의해 밀려난 이들을 포섭하여 적의 적은 우군이라는 정서를 불러일으켜 세력을 형성하였다.
조조가 後漢 황제로부터 선양을 목표로 우군확보를 고심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추천과 평가를 기반으로 관료를 임용하는 구품관인법을 제안하여 世族과 寒族을 막론한 모든 청류파 관료가 추천을 통한 지위세습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는 위진남북조代의 귀족사회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 결과 曹魏의 찬위에 동조하는 세력 결집을 유도하였고, 고명대신으로 선정되어 漢황실로부터의 선양에 기여하였다. 후일 고평릉 사변에서 불과 3천의 병력으로 낙양을 장악하고, 황족 겸 실권자인 조상을 타도할 수 있었던 저력에는 당대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사마의가 대변해주었기에 가능했다.
고평릉 사변의 성공으로 사마의는 曹魏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되었다. 그는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의 후손은 이카루스 패러독스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사마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강점을 반추해보자. 타산지석의 태도, 기회가 보장되는 자리 추구, 은원 및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능력. 이것들은 ‘자신의 영달추구와 스스로를 지키는 권모술수’ 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평릉 사변 이후 사마의가 가졌던 강점은 이후 사마가문 및 西晉의 약점이 되었다. 後漢-曹魏시대의 사마씨는 기본적으로 청류파 世族의 일원이었다. 가문의 격으로 봤을 때 이에 필적할 수 있는 가문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사마의가 정변을 일으킬 때 병권을 맡기려고 했으나 도주하여 조상의 편에 섰던 환범의 가문도 대표적인 청류파 世族 가문이었다.
사마의는 ‘사마씨 가문을 지키는 권모술수’의 일환으로 사마씨 가문의 라이벌 또는 반대파가 될만한 가문은 남김없이 제거했다. 조, 등, 정, 이, 필, 환, 장, 하, 왕, 하우 등 기반만 남아있었다면 향후 西晉의 동량이 되었을지도 모를 가문들이 사라졌다. 신생국 西晉의 북방에는 유연, 석륵 등 상대하기 버거운 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으나, 사마의의 숙청으로 西晉에는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제도를 정비할 인재가 남아있지 않았다.
인재 기근으로 중국의 여느 통일왕조와는 달리 西進은 건국 직후부터 쇠락의 기미가 보였고, 건국 26년만에 발생한 내란(팔왕의 난)으로 국가가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西進의 기풍은 무너졌다. 사회풍조는 악화되고, 保國安民은 시대착오적인 가치가 되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조조, 사마의가 그랬던 것처럼 유연, 석륵은 난세에 자신들이 주인공인 세상을 만들었다. 결국 이기는 사마의가 결국 패하는 사마씨를 만들었다.
사마의는 난세에 혼란을 극복하는 명장으로서 ‘천운의 상’이었고, 그의 권모술수는 統一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난세에 태어났던 그는 치세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치세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의 숙청은 또다른 난세를 불러왔음을 감안할 때 치세에는 난세를 부르는 ‘파황의 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