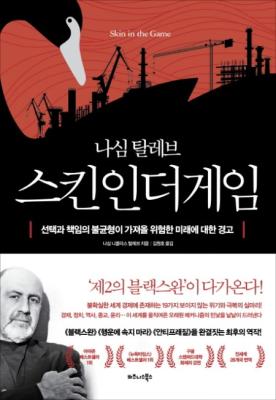2020-08-20
윤영삼
유럽 도시 기행 1
0
0
이번 기회에 읽게 된 "유럽도시기행1" 또한 여느 세계 특정지역 여행과 관련된 책처럼 이번에도 무겁지 않은 주제의 책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 고른 책 중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약 25년전 대학 입학후 1학년 1학기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약 3주간 다녀온 유럽배낭여행의 기억이 refresh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그 때에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하이델베르그,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갔었지만, 워낙 여행기간이 짧았고 철이 없던 시절이라 뭔가 implication을 얻지 못했던 것 같다. 하루하루 피곤해서 밤엔 곯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하면 그 날의 주요 플랜을 미루고 한낮에도 풀밭에서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난다.
본 책의 제목인 "유럽도시기행 1"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유럽도시기행 2" 및 그 이후 버전도 출간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머릿말에 "2"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빈, 체코의 프라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및 독일의 드레스덴이 다루어진다고 나온다), "1"에서는 그리스의 아테네, 이탈리아의 로마, 터키의 이스탄불 및 프랑스의 파리를 여행하면서 각각의 도시가 각기 다른 시대에 유럽의 문화수도 역할을 했고, 상기 네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룩한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성취가 인류문명 자체를 크게 바꾸었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나는 저자가 쓴 이 이야기가 상기 4개 도시 자체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첫번째 도시인 아테네는 철학과 민주주의가 탄생한 고대도시, 1,500년 망각의 세월을 건너 국민국가 그리스의 수도로, 비록 기운이 떨어지고 색은 바랬지만 내면의 기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멋있게 나이들지 못한 미소년으로, 두번째 도시인 로마는, 이탈리아 최악의 도시라는 소단원으로 시작되었지만, 대단히 현명하거나 학식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뛰어난 수완으로 돈과 명성을 얻었고 나름 인생의 맛과 멋도 알았던 빛바랜 명품 정장을 입고 다니는 전성기를 다 보내고 은퇴한 사업가로, 더불어 뜻밖의 발전을 허락하는 도시로 묘사되었다. 더불어, 세번째 도시인 이스탄불(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중심이었다)은, 다양성을 잃어버린 국제도시로 시작되어, 자신의 궁전에 유배당한 왕과 단색에 가려딘 무지개처럼 표현되었으며, 네번째 도시인 파리는, 초라한 변방에서 문명의 최전선으로 라는 소단원으로 시작되었고, 지구촌의 문화수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인류문명의 최전선으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은 것이 도시의 외면에 기초하여 저자 나름대로 구성된 context가 아닐까 싶다. 저자는 상기의 context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도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history)과 그 도시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사람의 생애(story) 관련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공부하였다.
위와 같은 저자의 방문 도시의 text에 기반한 context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통해 - 저자인 "유시민" 전 장관의 말처럼 - 낯선 도시를 여행하는 이유로 제시한,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 자신과 인간과 우리의 삶과 관련된 여러가지 감정을 맛보기 위해서 그 도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공감을 느낀다. 특히, 저자는 text와 context를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 전자인 text는 그 도시가 품고 있는 건축물, 박물관, 길과 공원 및 도시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후자인 context는 주어진 text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즉, 그 도시의 건축물과 공간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생각, 감정, 욕망 및 그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정보가 context라는 것이다. 저자는 도시는 그저 그 자신만을 보여줄 뿐, 누가, 언제, 왜, 어떤 제약조건 하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살피지 않는 사람에게는 context 자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주어진 text 하에서 그 text가 포함하고 있는 context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