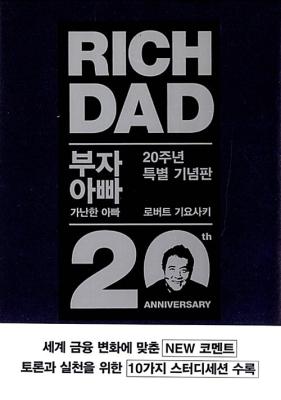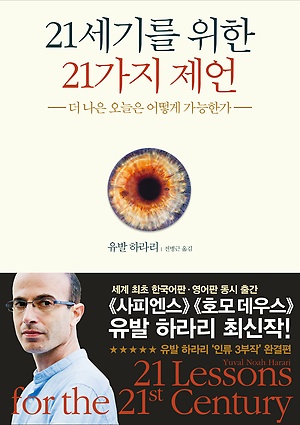2023-07-31
조수진
21세기를위한21가지제언
0
0
난 종교를 믿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종교를 등에 업은 ‘종교인’을 믿지 않는다. 기도를 하는 부모님에게 나는 차라리 그 시간에 TV를 보는 게 낫겠다고 말한다. 가만히 앉아 바라는 걸 되뇌는 행위가 과연 무엇을 바꾸겠는가? 때로는 스스로 화도 났다. 성당에서 보냈던 내 시간을 모아 다른 걸 했더라면, 적어도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신앙생활을 했을 땐 꽤 깊이 그들과 함께했다. 때문에 가까운 종교인들도 있었고,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봤다. 때문에 나는 그들을 종교와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바꾸려 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 어디쯤 자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고, 지친 나는 스스로 떠났다. 결코 그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종교라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도 했고, 그렇게 시야가 좁아져 귀를 막은 그들이 미웠다.
이런 내게 유발 하라리는 종교의 무서움을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유.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그들의 이야기. 어쩌면 기계와 알고리즘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더 많은 사람이 찾아갈 곳은 종교가 아닐지. 그렇게 그들을 조종할 종교란 무엇인지. 마치 펜으로 맨 등판을 벅벅 긁는 듯한 아픔이 있는 글자들이었다. 21세기의 종교는 비를 내리게도 못하고, 병 치료도 못 하고, 폭탄도 못 만들지만, ‘우리’가 누구이며 ‘그들’은 누구인지, 누구를 치료해야 하고 누구에게 폭탄을 투척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렇게 종교가 알고리즘에 침투하고, 기계 속에 자리 잡을 때면 그들은 인간들을 사로잡기 위해 건드린 ‘인간적인 면모’처럼. 기계를 사로잡기 위해 ‘기계적인 면모’를 건들지 않을까.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것을 망쳤을 때. 홀로 어둠에 남아 집히는 걸 모조리 던지며 눈물을 뿌릴 때. 그러다 지쳐 헛웃음만 나올 때. 문득 생각한다.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인류를 발전시킨 ‘기술’이 결국 모든 악의 근원인가 싶다. 그래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란 기술로 밥 먹는 내게 이는 꽤 큰 딜레마다. 어쩌면 ‘기술’이란 종교에 몸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렇다.
개발자로 꽤 오랜 시간 살아온 덕에 종종 듣는 말이 있다. 개발자여서 좋겠다는 말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웹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지 않느냐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어서 부럽겠다고 한다. 글쎄, 마냥 그럴까.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보다 경험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나아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고민이 있는데, 나보다 더 나은 기술자들에 관한 부러움. 그들과 좁혀지지 않은 간극, 그래서 나는 뭘 만들고 싶은 것인가 하는 고민. 그래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는 부끄러움. 앞으로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 결국 똑같다. 기술은 무한하고,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것마저 벅차다. 마냥 기술만 좇아서 될 일이 아니다. 늘 사람과 함께해야 하고, 때론 기술보다 중요한 게 많이 있다. 기술자로 살아가는데도 말이다. 하물며 인류 전체를 본다면, 정말 ‘기술’이 언제나 정답일까.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눈이 적응해 조금 흐릿하게 보이곤 한다. 그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견뎌보지도 않고 어둠을 논하는 건 꽤 어리석지 않을까. 그저 텍스트로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휘젓고, 내 머릿속을 마저 마구 휘저은 유발 하라리의 논리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한다. 할 수만 있다면, 유발 하라리에게 나에 관한 21가지 제언을 올려보라고 하고 싶다. 그는 과연 내 21가지 문제를 어떻게 고를까.
21가지 제언을 위해서 하라리는 인류의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읽고, 엮고, 그 정보 속에 살았을 것이다. 나에 관한 21가지 제언을 쓴다 해도 하라리는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라리에게 부탁할 수 없으니, 나 스스로 내게 21가지 제언을 해야 할 테다. 나 역시 그처럼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읽고, 엮고, 그 정보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이라면, 내가 바랐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들, 여전히 그것을 위해 움직이는 내 이야기 역시 무의미하진 않겠다. 내가 어디에 취했었든, 내가 어디에 취해있든. 어쨌든 나란 사람은 내 세상에 살 테니 말이다.